[미디어스=윤광은 칼럼] 영문학자 조너선 갓셜은 한국에서 올해 초 발간된 『이야기를 횡단하는 호모 픽투스의 모험』에서 이야기에 관한 시급한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로부터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다. 조너선 갓셜은 이야기가 사람을 구슬리는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것이 인류사를 관통해 얼마나 뿌리 깊게 작동해 왔는지 고한다. 그가 말하는 이야기는 이야기의 형식으로 설파되는 관념과 주장들, 이를테면 사회적 서사 혹은 현실의 서사화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타인을 설득하고 공론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사실을 쌓아 올린 논변보다 지적 방어망을 느슨하게 푸는 스토리텔링이 효과적이다. 이야기는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고 공감 능력을 육성하기도 하지만, SNS의 부상과 정치적 양극화를 타고 대결과 반목, 증오와 거짓 같은 독소를 퍼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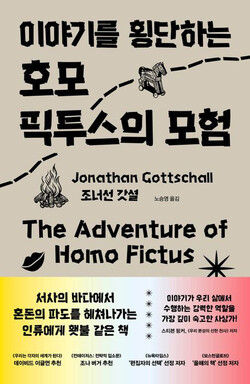
조너선 갓셜은 스토리텔링에는 보편적 문법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곤경에 처한 인물이 등장하며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대립한다. 이야기에는 문제와 악당이 필요하다. 선과 악, 도덕주의에 몰두하는 것이 이야기의 본성이다. 세상을 문제투성이로 보도록 이끌고 책임을 진 악당을 지목해 처벌을 유도한다. 이는 사회적 서사가 신진대사하는 전형적 양상이며 공동체의 수호란 테마로 연결되곤 한다.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소식이 떠도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이야기와 닮은 전언의 형식으로 퍼지는지, 나아가 이 사회 시민들이 제각각 서사화된 관점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정파와 이념에 따라 세상을 망치는 빌런을 지목하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 서사가 저마다의 세계관이 되었다.
뒤집어 말하면, 이야기는 외부의 적에 대해 공동체를 결속시켜 주는 해법이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말이다. 그렇기에 진영논리란 키워드와 떼놓을 수 없다. 오늘날 사회는 온라인을 따라 분절된 공간으로 잘게 다져졌다.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는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개인들의 취향과 정견과 이념과 젠더를 묶는 공동체가 되었으며 정체성 정치가 실천되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 내집단에 명시적 구심력을 제공하는 토템과 같은 존재, 내 정체성을 대표하고 의탁하는 존재를 섬기는 팬덤 현상이 보편화됐다. 이것이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와 여론이 조직되는 원리가 됐고 정체성의 동질성과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됐다. 이제는 정설이 된 팬덤에 관한 속설이 있다. '위기가 닥칠수록 팬덤은 단단해지고 코어화된다'. 스스로를 박해받는 주인공의 자리에 놓는 이 고난의 서사는 고립이 악덕이 아니라 미덕이 돼 버린 팬덤 사회의 뒤집힌 균형감각을 알려준다.
오늘날 사람들의 사회 참여방식은 팬덤-소비자 지위에 바탕을 둔 불매 운동과 화력전이다. 이 양상은 팬덤 공동체를 이루는 요소들, 취향과 이념이 결합하여 제기된다. 우리의 입장과 어긋나는 사회 동향을 성토하기 위해 커뮤니티 ‘댓글’과 SNS ‘리트윗’을 동원해 소란을 피우고 우리가 소비하는 분야의 ‘니즈’와 배치되는 인물에게 낙인을 찍고 퇴출을 종용한다. 나와 다른 입장을 제거하고 나의 반대자들을 박멸하려는 ‘궁극적 해결책’이다. 이렇듯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좇는 충동이 보편적 해결책이 된 이유는 그것이 사실은 실현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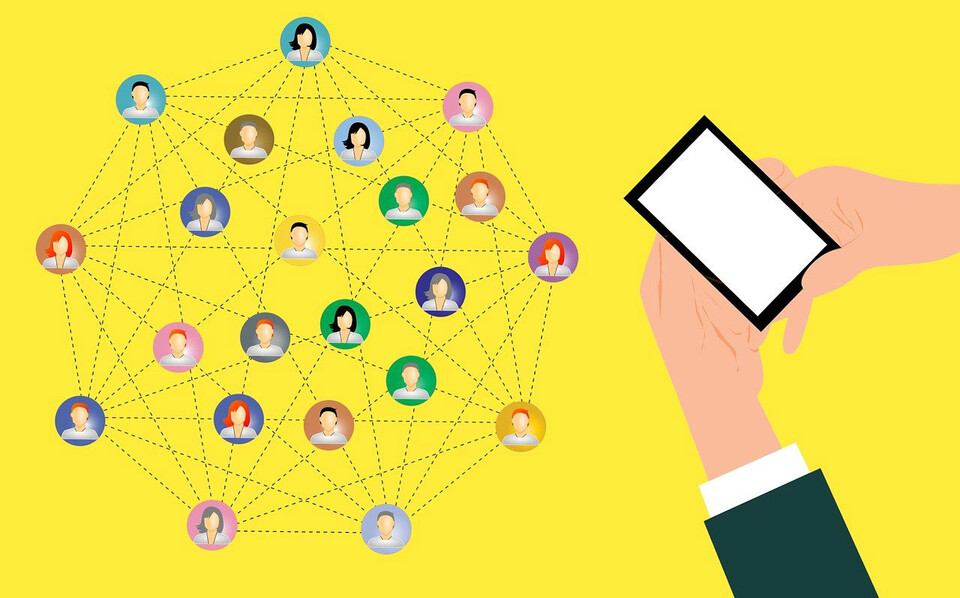
상대의 존재를 이 사회에서 제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머무는 SNS 타임라인과 커뮤니티에서 제거할 수는 있다.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진 이들로만 타임라인을 구성하고 커뮤니티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축출해 낸다. 세상을 찰흙처럼 주물러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빚고 있다는 자족감을 얻는다. 이 고립과 폐쇄화에 자연의 섭리처럼 덧씌워지는 원리는 알고리즘이다. 적극적으로 타임라인을 만들거나 외부 인자를 몰아내지 않아도 영상과 콘텐츠를 찾아보는 일상적 행동이 집적되며 내가 늘 보는 것만 존재하는 세계가 도래한다.
팬덤 공동체의 집단주의는 스스로의 동질성을 한없이 추구하는 순혈주의와 배외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타 집단과 교환되지 않는, 거의 종적인 수준의 정체성으로 재현되기에 사회의 부족화, 부족주의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집단주의이되 취향과 정체성 정치에 의거해 구성되므로 집단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으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의 변종 혹은 개인주의의 다수화된 버전이다. 조너선 갓셜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소비하는 이야기에 의해 창조된 정신적·정서적·상상적 공간”을 뜻하는 서로 다른 '이야기 우주'들이 단절된 채 고립과 극단화를 부르는 현상이 사회의 부족화, 팬덤화인 것이다. 이야기에 맞춰 왜곡된 현실들이 “‘우리’를 더 극단적인 버전의 ‘우리’로, ‘그들’을 더 극단적인 버전의 ‘그들’”로 갈라놓는다.
데이터 과학자 데이비드 로빈슨은 픽션 플롯 11만 2000개를 통계 분석한 뒤 이야기의 일반적 전개 방식을 요약했다. “상황이 나빠지고 더 나빠지다 마지막 순간에 좋아진다.” 픽션과 달리 현실의 사회적 서사는 해피엔딩을 노정하지 않는다. 잠정적 승리는 있어도 최종적 승리는 없다. 영원한 위기와 투쟁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진영 논리의 존재 방식이며 사회경제적 전망이 부재한 사회 현실의 귀결이기도 하다. 각각의 진영에 부재하는 해피엔딩과 포지티브한 전망을 채워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뽕'이란 메타 서사다. '국뽕'은 사회단위 원자화의 반례가 아니라 팬덤 현상이 국가 단위로 발전한 상태인 것이다. 진영 논리로 갈가리 찢긴 시대상 속에 유일하게 작동하는 사회 통합 기제는 국가 단위, 민족 단위의 진영 논리다. 세상은 쪼개지는 동시에 합쳐지고 있으며 개인주의/부족주의는 민족주의와 공존하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