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현태 칼럼] 다가올 2050년,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경제 구조의 대전환, 그리고 AI·로봇·스마트시티·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 수요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에너지 전략으로 이 거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선 후보 간의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뜨겁게 논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에서 출발한 논의보다는, 경제성과 이념 논쟁에만 갇힌 채 본질적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냉철하고 현실적인 에너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과감하게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이뤄졌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과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라는 고통도 함께 따랐습니다. 이는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때,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값진 교훈을 줍니다.
한국은 원자로를 설계하고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원료인 우라늄은 단 한 톨도 자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에너지 안보는 자원 보유 여부와 공급망 다변화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왜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들은 투자 유치 시 ‘RE100’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이니셔티브를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연 원자력 70%라는 비중은 가능한 일일까요? 현실적인 목표는 원자력 40~50%, 재생에너지 30~40%, 기타 전원 10~20%가 적절합니다. 원전은 고도의 기술과 중앙집권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민주적 통제가 어렵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지역사회 수용성, 인허가 절차 등의 거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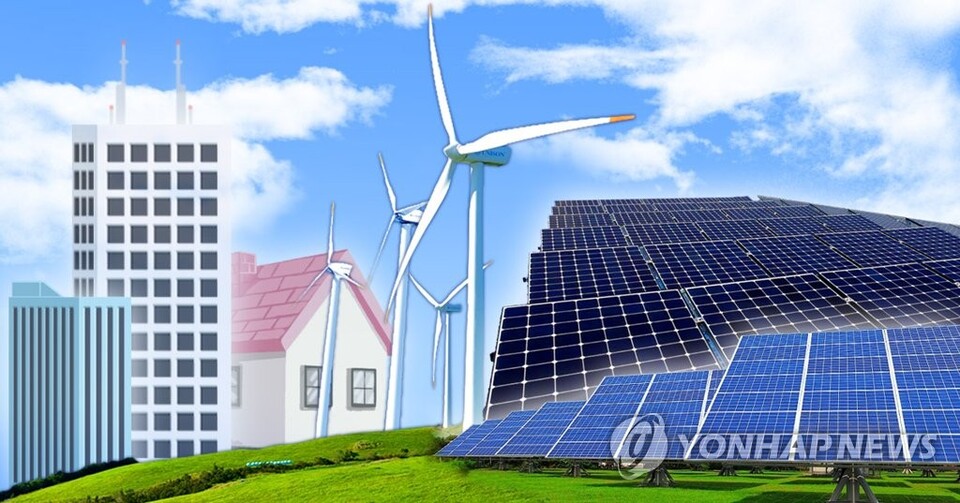
반면, 재생에너지는 국민 참여형 분산 전원입니다. 태양광 1MW 설치에 10억 원이 들고, 천 명이 1인당 1억 원만 투자해도 1GW의 발전설비가 세워집니다. 설치와 시공 과정에서는 지역 공사업체가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큽니다. 단순히 발전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SMR(소형 모듈 원자로)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기술적·경제적 과제가 많습니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기술만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에너지원 선택은 경제적 논리나 기술적 가능성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그 목적은 국민 모두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공격적 어투와 비아냥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토론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익적 관점에서 차분하고 깊이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담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말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A society grows great when old men plant trees whose shade they know they shall never sit in" (노인들이 자신은 결코 앉을 수 없는 그늘을 위해 나무를 심을 때, 사회는 위대해진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