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회사원 친구 3명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 중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한 놈이 갑자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라는 게 결국은 상사 눈치 잘 보고, 적절한 코멘트 달고 하는 게 전부야. 내가 유럽으로 출장 간 적이 있거든. 작은 계약 건이었는데, 처음에 난 거기 선배들한테 인정받으려면 멋진 프레젠테이션으로 계약 따고, 악수하고, 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다 필요 없더라고. 알다시피 유럽 담배가 엄청 비싸잖아. 면세점에서 담배나 두둑이 사들고 가면 끝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거야”
그렇게 친구는, 꽤 긴 시간 직장인이 밥벌이를 하며 겪는 비루함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우리 같은 직장인은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할 수밖에 없어. 죽을 때 까지 스스로를 개발해야 되는 거지. 멈추면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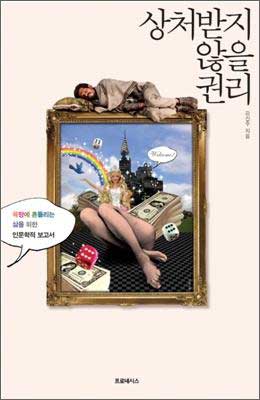
그 순간, 이야기는 밥벌이의 비루함을 거쳐, 직장인의 성공방법에 대한 자세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었습니다.‘아니 이 바닥에서 인정받는 게 눈치 빠르게 윗사람 대하는 거라면서, 결론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이라니.’의아했습니다.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친구의 눈빛이 너무 단호해 묻진 못했지만 말이죠. ‘얌마, 너 근데 행복하니?’
결국 여의도 증권가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자기 혁신을 이야기할 대 가장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였습니다.
“야. 근데 자기 혁신은 왜 하는데? 뭘 위한 자기 혁신이냐? 오래 회사에 버티려고? 그렇게 자기 혁신 열심히 해서 회사에 오래 살아남으면, 그 다음은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그럼 행복한 거냐?”
대기업 친구는 ‘이런 철없고 어린 녀석을 봤나’하는 눈빛으로 날 바라보며 질문을 외면했습니다. 증권가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눈에, 난 세상을 너무 모르는 숙맥이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축구장 안에서 어떻게 주전 선수가 되고, 골을 넣어야 할런지 고민하고 있는데, 난 그 친구들에게 축구는 왜 하고, 골을 넣으면 뭐하냐고 반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화는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일어날 무렵, 고개를 끄덕이던 증권가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질문을 다 이해하진 못하겠는데, 자기 혁신 계속하며 사는 게 즐겁진 않을 거 같다.”
분명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공기처럼 당연한 제도입니다. ‘자본주의는 좋은 제도인가?’란 질문은 ‘인간은 왜 사는가?’란 질문만큼이나 막연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왜 굿모닝인가?’란 질문만큼이나 황당합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의 세례가 너에게 아이팟과 PMP의 은총을 내리리니, 의심하지 말고 너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를 따르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이루어 질 지어니, 다만 열심히 화폐를 축적하라.”
분명 자본주의는 선택의 자유를 넓혀줬습니다. 이제 돈만 있으면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는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 한 것일까요? 왜 나도 자기혁신을 주장하던 대기업 친구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친구는 끊임없는 혁신을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도태되는 순간 수입은 끊기고 화폐의 은총 속에 마음껏 누리던 자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 소비하기 위해선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선 혁신을 멈춰선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린 끊임없이 소비하기 위해 노동합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의 계급을 생산수단이 결정한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소비가 계급을 결정하는 사회입니다. 루이비똥을 사는 사람과 동대문 가방을 사는 사람, 벤츠를 타는 사람과 마티즈를 타는 사람은 같은 월급을 벌더라도 다른 계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결국 높은 계급에 도달하기 위해선 비싼 제품을 사야하고(살 수 있어야 하고), 비싼 제품을 사기 위해선 노동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친구 표현에 따르면 자기 혁신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자기 혁신을 멈추지 않는 일은 고됩니다. 이 때 고된 몸과 마음을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들이 달래줍니다. 소비를 하고 나면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노동자들은 또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마르크스가 예견한 혁명은 일어나지 않겠죠. 노동의 소외에서 오는 괴로움은 구찌 명품백과 벤츠가 구원해주니까요.
하지만 소비의 구원은 찰나적입니다. 반면 노동의 소외가 가져다주는 고통은 영속적입니다. 구찌 백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짧지만, 김 부장의 갈굼과 단락의 줄을 맞추는 문서 작업은 쉴 새 없이 이어진다는 의미죠. 만약 문서의 줄을 잘 맞추고 김 부장의 갈굼에도 실실거린 결과물이 윈도우(Window)나 맥북(Mac Book) 정도라도 되면 노동을 견딜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견딘 갈굼과 잡일의 고통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도통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난 무얼 위해 일을 하는 걸까. 우린 허탈해집니다. 이 허탈감이 바로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던 소외입니다. 결과물을 만지지 못하는 노동은 결국 소외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분업이 더욱 고도화된 지금, 노동의 소외가 주는 고통은 마르크스의 시대보다 심하면 심하지 절대 덜하진 않습니다.
물론 노동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대기업 친구가 소비에 대한 열망을 조금만 줄인다면, 자기 혁신에 따른 고통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구찌 백에 대한 미련을 조금만 줄인다면, 김 부장의 갈굼을 참고 견딜 필요가 없을 거고요.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도 밥벌이는 힘들었나 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쾌락을 강조한 에피쿠로스학파는 쾌락을 얻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기들에게 치욕을 안겨줄지도 모르는 변덕스러운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위해, 아테네 상업 세계의 고용 관계에서 자신들을 제외시키고, 독립을 누리는 대신에 보다 검소한 생활방식을 수용했다.” 그 결과 에피쿠로스는 자유의 쾌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노동의 피로를 줄여라. 말이야 쉽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대기업 친구는 결국 자기 혁신에 대한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견뎌낼 겁니다. 왜일까요?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DSLR이 나오고, PMP가 나오고, 터치 폰이 등장하고, 몇 년 전까지만 없던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상품이 나온 지금 첨단 기기들은 우릴 유혹하고, PMP나 터치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도 오늘날의 최신 제품을 경험했다면, 아마도 '이봐. 난 어제 부터 일을 시작했다네. 에피쿠로스는 자네가 잘 지키게' 하고 떠났을 겁니다.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허영심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허영심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소비에 대한 화수분 같은 욕망이 탄생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고, 명품 백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자 하는 인간의 허영심 때문에, 우린 수많은 백화점과 광고, 도시를 화려하게 수놓는 상품의 전열 속에서 허우적 거립니다. 집어등의 강력한 불빛을 보고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오징어처럼 우리는 자본주의의 화려한 불빛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대의 노예들에겐 노동이 전부였다./ 하지만 현대의 노예들은 쇼핑까지 해야 한다.’ 박민규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노예는 스스로 노동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현대의 노동자들 역시 노예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대인은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소비는 노예의 삶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바꿔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대의 노예가 그랬듯, 우리도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무수히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거부해야 할까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요즘 힘든 건, 순전히 당신 책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본주의가 당신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냥 자기 혁신해야 한다며 굳은 의지를 다지며 자본주의가 주는 상처를 고스란히 감내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애초부터 우리 모두에겐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P.S: 위 내용은 철학자 강신주의 흥미롭고 날카로운 책, <상처받지 않을 권리>를 읽고 끄적 거린 글입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시길.
|
책, 영화, 여행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추구하는 부지런한 블로거, ‘알스카토’입니다. (http://blog.naver.com/haine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