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네이버가 칼을 뽑아 들었다. 그동안 말을 듣지 않았던(?) ‘쿠키뉴스’를 특별히 설정하지 않아도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는 ‘기본 언론사’에서, 개개인이 설정하지 않으면 메인에 보여주지 않는 ‘선택 언론사’로 바꿔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쿠키 뉴스는 실질적으로 네이버 메인에서 퇴출 당했다.
사실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뉴스캐스트 오픈 초기, 네이버가 계약한 43개 언론사중 14개 언론사만 기본 언론사로 채택하겠다고 얘기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봐도 좋겠다(현재 국민일보 제외 35개 언론사가 기본형으로 등록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해, 네이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갑’의 입장에서 벗어날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뉴스캐스트는 네이버가 ‘언론’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만든 서비스다. 한국 최대 포털의 첫화면 일부를, 스스로 편집하지 않고 개별 언론사에게 맡겨버림으로써, 이전에 네이버 첫 화면에서 불거졌던 모든 시빗거리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 물론, 뉴스 서비스가 수익에 꽤 큰 영향을 미치기에 버리고 갈 수는 없었던 네이버의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뉴스캐스트는 개편 초기부터 가장 많이 화젯거리가 되었다. 특히 신문사 홈페이지의 접속자 숫자 증가는 네이버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쿠키뉴스 역시 네이버의 개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매체중 하나였다. 개편 이전 월 150만UV 에서 개편이후 1200만까지 접속자 숫자가 늘었던 것이다. ... 그렇지만, 이는 동시에 네이버의 개편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올 것인지도 증명하는 사례다.
아직까지 인터넷 뉴스 조회수는 ‘제목’이 90%를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웹 콘텐츠 소비의 속성은 결국 ‘어뷰징’ 또는 ‘낚시’라 불리는 선정적인 기사의 배치와 제목 편집을 낳을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이런 위험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다. 애당초 뉴스캐스트 자체가 어뷰징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쿠키뉴스도 이런 적절한(?) 제목 편집을 통해 36개 언론사 가운데 접속자 숫자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할 수가 있었다.
결국 이번 쿠키뉴스의 퇴출은 자신이 만든 서비스의 맹점을 가리기 위한 쇼다. 그리고 쿠키뉴스는 ‘시범 케이스’로 당했다고 볼 수 있다. “봐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쿠키뉴스라도 잘라낸다. 너희들도 똑똑히 기억하라.” ... 이게 네이버가 다른 언론사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다. 아, 물론 조중동은 제외이지 않을까? ... 예를 들어, 지금 이 시간 동아일보 뉴스캐스트 제목 몇 개만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日 포르노배우가 낯익을 정도로…
YS, 박지원에 “DJ는 빨갱이”
거꾸로 선 비키니…뭐지?
베컴 부인 환상 몸매
... 스포츠 신문 아니다. 일간지 동아일보다. 근본적으로 쿠키뉴스가 했던 일과 지금 동아일보가 하는 일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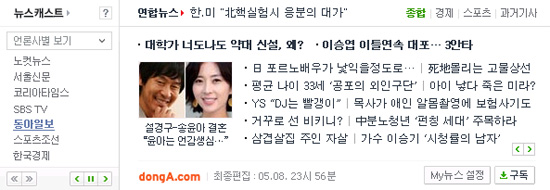
물론 네이버는 사적인 기업이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자신의 규칙을 지키길 요구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문제는, 예전에 14개 언론사만 기본 언론사로 설정한다고 했을 때도 그 근거를 밝히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쿠키뉴스가 퇴출된 근거를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자신들이 선정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말만 앵무새같이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지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자신의 힘은 휘두르겠지만 남의 감시와 통제는 받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다.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이버는 사기업이다. 하지만 공익성에서 자유로운 기업은 어디에도 없다. 한 사회에 근거해 존재하는 한, 어떤 기업도 공익성을 무시한 채 철저한 이윤만 추구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유통은 분명히 공익적인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 네이버는 ‘슈퍼 갑’이다. 접속자수 2위인 쿠키뉴스가 단칼에 잘려나가도 아무말도 못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이제 네이버나 다음 등, 거대 포털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데 그 과정은 모든 것이 가려져 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했는지가 보여지지 않는다.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만 할까. 네이버나 다음 등이 미디어가 아니라고 스스로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을 일부나마 옹호했던 것은 ‘정보의 흐름’이 막혀서는 안된다는 이유였다. 언론법을 통해 포털을 옭아매려는 정치권의 의도가 너무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 그런데 그 포털이 이제는 이빨을 드러냈다.
네이버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구차하다. 아니, 꽤 구차하다. 제목 편집을 포기하겠다면서 내놓은 서비스에서, 자기들 맘에 안들게 행동한다고 매를 드는 모습이, 구차하다 못해 치졸하다. 하지만 치졸만 하면 다행이다. 무서운 것은, 이런 행동과 결정들이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이미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은 공공재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 앞으로 휴대폰이 없어진 세상을 쉽게 상상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요금 조정을 통신사들이 요구받는 것처럼, 포털도 이제는 뭔가 다른 대접을 받으며 행동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그런 네이버에서 지금,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언론사 어르기’와 ‘모니터링을 통한 검열’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망 중립성’에 대한 고려, 더 많은 정보가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대한 고려가 아니다. 반대로 정보의 흐름을 막으면서 자신들의 관점에 맞게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최근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정보나 블로그 글이 씌여지면 무조건 신고해서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이 추세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이상 이런 결정들이 비밀리에 이뤄지도록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자르려면 잘라라. 그렇지만 최소한 납득은 가게 해 달라.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그 판단 과정을 공개하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달라. 사기업이란 그늘 밑에 숨어서 정치권과 사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어쩌면 이번 쿠키뉴스의 뉴스캐스트 퇴출이 우리에게 주는 딱 하나의 화두가 그것이다. 이제 네이버나 다음도, 시민사회의 감시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