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추석 연휴가 끝났다. 언제나 그렇듯 명절 연휴를 앞두고는 명절 스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화제에 오르고, 늘 수위에 오르는 것은 관심인지 잔소리인지 모를 어른들의 한 마디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짜증이 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결혼 언제 할래?' '결혼 안 하니?'라는 건 이제와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다.
그런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입장은 명확하다.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꽃보다 할배'의 마흔을 한참 넘은 노총각도 마음만 앞서는 게 결혼 아닌가. 결혼을 해도 문제다. 할 말 없는 어른들의 한마디처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시댁에서, 처가에서 추석을 지내는 데에는 현실적 문제가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인륜지대사 통과의례들이 우리 사회에선, '스트레스', '증후군'이란 말과 동행하고 있다.
하지만 꽉 막힌 교차로 같은 현실이 텔레비전 안으로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짝 갬'이다. 추석이 지난 9월23일 검색어 중 하나는 '준수 호박'이다. <아빠! 어디가?>의 꼬마 출연자 준수가 자기 덩치만한 호박을 들고 쩔쩔 매는 모습이 대견하고 귀여워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이다. 단지 오늘 만이 아니다. 언제나 <아빠! 어디가?>가 방영된 날 이후 하루가 지날 때까지 검색어 중 일정 부분은 이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몫이다.

아이들의 '종류(?)'도 다양하다. <아빠! 어디가?>의 출연자들이 이제 좀 뻔하다 싶으니, 조금 다른 아이들이 나타났다. 생후 4개월에서부터 초등 4학년까지, 취향껏 골라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들 군단이 등장한 것이다.
한때 '바람'이란 별칭으로 불리던 개그맨은 마흔이 넘은 늦깎이 아빠가 되어 아이들 응급실 행으로 호들갑을 떨고 눈물바람을 하며 아이들을 돌본다.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화면 속 아빠들은 비록 제한된 시간이지만,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씻겨 주고 보살펴 주고 물고 뜯으며 행복의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현실의 아빠들은 텔레비전 채널을 두고 아이처럼 같이 싸우거나, 아이들의 울음과 짜증에 자기가 먼저 짜증을 부리거나, 똥이라도 쌀라치면 저만치 줄행랑을 치는데, 화면 속 아빠는 서슴없이 아이의 똥덩이를 만지고 치워주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희한하게도 남의 신랑인데 내 신랑 같고, 남의 아이인데 내 아이 같은 공감을 가지고 미소를 지으며 화면 속에 빠져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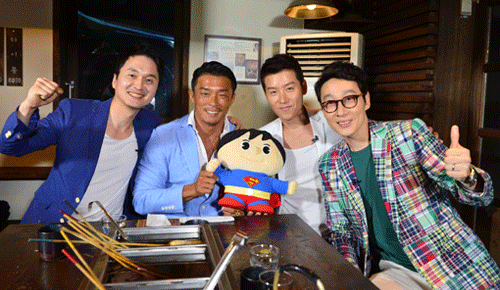
부모 자식만 있는 게 아니다. '백년손님'이라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위도 텔레비전 속에선 '신식'이 됐다. 장모에게 친엄마처럼 '반말지꺼리'를 하는가 하면, 장모 얼굴을 걱정하고 함께 앉아 음식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고부 사이는 <고부 스캔들>(jtbc)에 모여 앉아 속을 터놓는다. 텔레비전이 해결하기 시작한 건 고부 문제만이 아니다. 부부 문제는 이미 아침 토크쇼로, 심야 예능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까지 텔레비전이 해결사가 된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자기야>라는 포맷이 진부하다 하여 <백년손님>으로 신장개업을 했을까.

그저 우리들은 리모컨만 있으면 된다. 예쁜 아기를 귀여운 아이를 듬직한 자녀를 자상한 사위를 맛있는 집밥을... 원하는 곳으로 리모컨만 돌리면 된다. 점점 더 현실에서 누리기 힘든 것들이, 결핍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빛나며 우리를 반긴다. ‘어서와, 가정이 그리웠지, 따뜻한 가족을 원하지?’라며.
|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톺아보기 http://5252-jh.tistory.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