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장주영 칼럼]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한국 문학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인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가의 소설을 두고 역사왜곡이니 노벨문학상 수상이 대노할 일이라고 말하거나 보도한 언론이 있다. 비슷한 내용으로 비난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을 폄훼해왔던 언론이나 정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러 가짜 정보만을 골라서 활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부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진실을 외면할 때 나타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들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 기성 언론외에도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이 1인 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 언론, 아니 진실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언론이 있을까?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여 진실한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가? 전제 사실이 잘못되면 그로부터 이어지는 의견도 엇나갈 수밖에 없다.
진실한 사실이란 ‘거짓이 없는 사실’이다. 일부 편향되거나 허위사실을 안다고 해서 진실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연관된 사실을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진실에서 멀어질 수 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인간은 또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가? 여러 자료와 통계를 들여다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매우 수고스러운 과정이다. 어쩌면 내가 품었던 지식이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다.
진실을 마주하는 일도 힘들지만 과거 허위사실을 발설한 잘못을 인정하는 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사실을 확인한 뒤 진실만을 보도하거나 발언하기는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 진실이 밝혀진 사건과 다르게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일부 사실만 알려지는 경우가 흔하다. 심지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기도 한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조사위원회나 후속 언론보도로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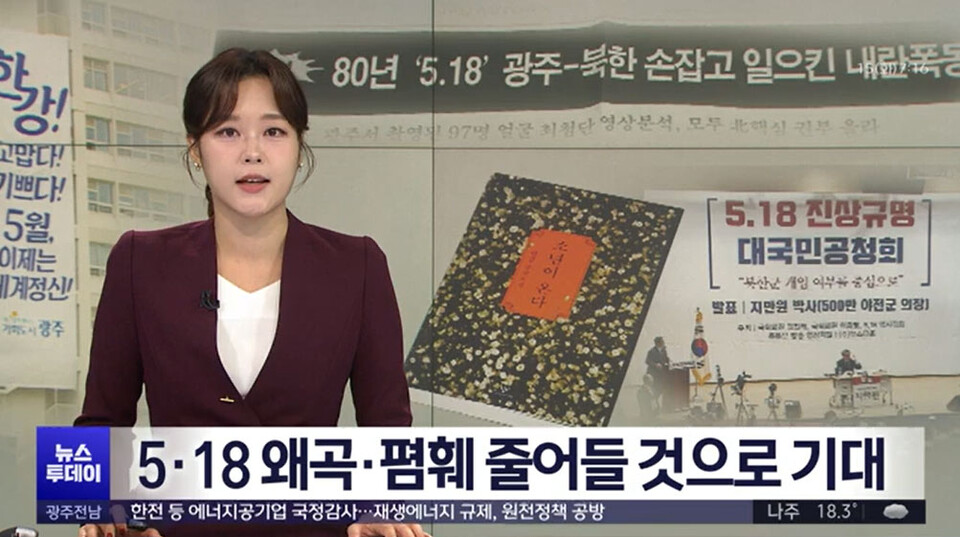
나중에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거의 허위 보도나 발언을 인정하고 정정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기성 언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람, 예컨대 정치비평가나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다. 영향이 크면 책임도 당연히 커진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자신의 거짓말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얄팍한 희망에 기대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이거나 대중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대중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하지 않던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하고도 ‘웃자고 말했더니 죽자고 달려 드네’라며 슬그머니 빠져나갈 일이 아니다. 허위사실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말장난이다.
역사적인 일이든 현실 문제든 인간관계든 진실에 관심이 없어질 때, 진실을 아는 데 게을러질 때 바보가 된다. 진실을 향한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자.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 장주영 언론인권센터 부이사장(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칼럼은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에서 발행하는 '언론인권통신' 제1039호에 게재됐으며 동의를 구해 미디어스에 싣습니다.
* 미디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언론인권센터 한국미디어피해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591-2822, 온라인상담 http://www.presswatch.or.kr/)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