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광은 칼럼] 『정정하는 힘』은 작년 연말 한국에서 출판된 일본의 사상가 아즈마 히로키의 책이다. 아즈마 히로키는 일본에 필요한 건 ‘정정하는 힘’이라고 말한다. 그는 일본인은 나이 먹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단순하고 폭력적인 담론이 횡행할 뿐이다. 하지만 나이 먹는 것을 피할 수는 없고, 늙음을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언어를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든다는 건 젊을 때의 과오를 ‘정정’해 가는 일이다. 스무 살, 서른 살의 나와 마흔 살, 쉰 살의 내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기에 그 사실을 인정한 채 스스로를 갱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이며, 아즈마 히로키가 말하는 ‘정정하는 힘’의 한 맥락이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영포티’ 논란을 보며 일 년 전 읽었던 이 책이 떠올랐다. ‘영포티’는 10년 전 등장한 말이다. ‘젊은 40대’를 뜻하는 이 말은 어느덧 밈을 넘어 멸칭이 됐다. 2030 ‘MZ 세대’ 사이에서 ‘영포티’를 향한 혐오감이 퍼지고 있다고 한다. 우스꽝스럽게 젊은 척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조롱과 젊은 세대의 좌절과 박탈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한 마디로 ‘영포티’를 세대 간 갈등의 산물로 진단하는 이야기다. 동의한다. 나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신랄한 어조로 비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들은 사회문화적 관점에 머문다. 이 현상이 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 다른 층위를 읽을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영포티’ 담론의 사회심리적 밑바닥을 더듬어 보려 한다.
나이 듦에 관한 아즈마 히로키의 말은 한국에도 그대로 포개진다. 이곳에서도 늙음을 긍정하는 언어는 사라졌다. 전통 사회에서 늙음은 시간과 맞바꿔 축적되는 보배였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풍부해지고 지혜로워지며 덕성을 쌓는다는 믿음이다. 이제 그 말을 빈말로라도 믿는 사람은 없다. 노인들은 ‘틀딱’이라 불리고, 중년 남성은 ‘개저씨’로 호명된다. 아무에게나 반말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며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추물들, 어떤 젊은 세대의 눈에 비친 어떤 기성세대의 모습이다.
‘영포티’ 현상 아래엔 노화에 대한 기피 심리가 깔려 있다. 한국 사회에서 늙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효용의 상실로 여겨진다. 나이 듦은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외적 가치의 소멸과 직결되고,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계발 능력의 퇴화로 인식된다. 사람들은 나이 듦을 극복해야 할 결함으로 받아들이며, 신체 변화를 통제하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 ‘영포티’는 바로 그 사회적 강박이 응집된 형태다. 늙어가는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세대의 초상이다. 젊음이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는 시간이라면, ‘영포티’의 젊음은 노화가 펼쳐진 미래를 회피하며 현재의 닫힌 시간 속에 자신을 봉인하려는 시도다.

이 강박은 산업 구조에 의해 강화된다. 자본은 늙음을 질병처럼 취급하며 시간을 지배하는 상품을 만들어냈다. 뷰티 산업과 피트니스 사업, 안티에이징 피부과 시술의 확산이 그 결과다. 이는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늦출 수 있다’는 믿음을 상품화한 것이다. 최근 한 내과의가 주창하며 트렌드가 된 ‘저속노화’ 역시 그렇다. 몸에 좋은 먹거리를 챙겨 먹는 것은 건강을 위한 실천이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노화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슬로건이다. 이것은 늙음에 대항해 시간의 속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판매하는 일이다. 젊음이 상품으로 유통될 때, 인간의 시간은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고, 자기 관리의 윤리는 자기 통제의 강박으로 변한다. 사회는 늙지 않는 몸을 ‘정상’으로, 늙어 빠진 몸을 ‘관리 실패’로 규정한다. 노화에 대한 멸시는 제도화된다.
사십 대는 젊음에서 늙음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서 있다. 진시황의 꿈처럼 젊음을 연장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사회에서, 기꺼이 젊음을 택하지 않을 사람은 드물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의 윗세대보다는 어린 세대와 호환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체득하며 자라난 세대라 ‘나는 여전히 젊다’는 자의식에 젖기 딱 좋다. 하지만 그건 미디어가 만들어낸 세대론이다. 현실에서 젊음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저 ‘저속노화’의 가판대에 지불할 돈과 시간이 있는 이들만이 실질적으로 젊음을 소유할 수 있다.
중산층 이하의 사십 대 다수는 먹고사는 문제에 치여 자신을 꾸미거나 삶을 즐길 여유가 충분치 않다. 미디어는 늙지 않는 중년 셀럽의 이미지를 전시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마주치는 건 배 나온 아저씨의 실루엣이다. 이 인지적 부조화는 ‘젊지 않으면서 젊은 척하는’ 이들을 향한 조롱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당신은 정우성, 이정재가 아닙니다”라고 이죽거리는 것이다. 젊은 사십 대는 소비를 통해 젊음을 갱신할 능력을 가진 중산층 이상의 특권적 정체성이다. 말하자면, '영포티' 논란의 한 실체는 세대 내 계층 격차가 세대 간 문화 갈등으로 전치된 형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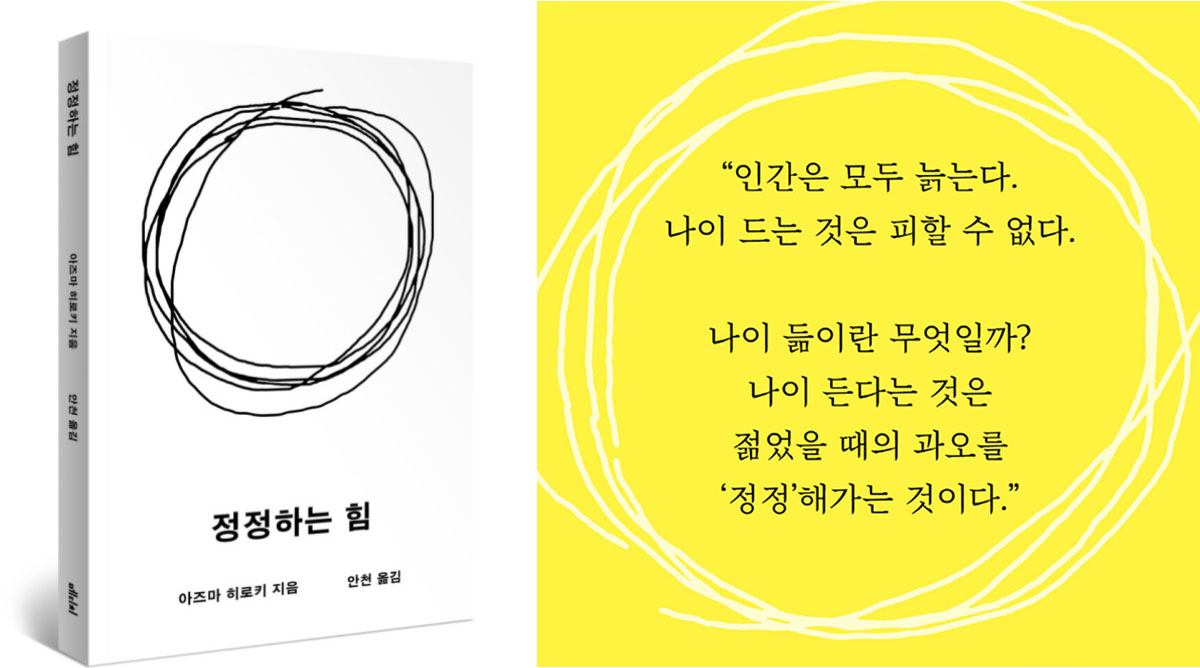
이 혼선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첫 문단으로 돌아가서 모색해야 할 것 같다. 이 사회에도 늙음을 긍정하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때문에 젊음에 대한 강박과 노화에 대한 기피가 창궐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늙음을 긍정하는 담론을 조직해야 한다. 중년 세대를 미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기층 중년들의 삶의 조건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드러내자는 말이다.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중년의 이미지는 어느 쪽으로든 현실과 동떨어진 허수아비에 가깝다. 이런 왜곡 속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리 없다.
‘영포티’와 ‘영피프티’ 당사자들에게도 이 담론은 달콤한 독약이다. 젊은 세대에겐 한바탕 비웃음거리일 뿐이지만, 그들의 삶의 문제를 덮어 가리고 억압하는 허위의식이기 때문이다. '영포티' 논란을 극복하는 길은 이 허위의식을 몰아내는 것에 달렸다. 늙음을 부정하는 대신 삶을 직면하고 갱신하는 힘, 정정하는 힘을 되찾을 시간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