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광은 칼럼] 엠넷이 다시금 힙합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쇼미더머니>가 3년 만에 방영이 확정됐고, 이번 달엔 여성 래퍼 판 <쇼미더머니>였던 <언프리티 랩스타>가 돌아온다. <쇼미더머니>의 부활은 예전부터 흘러나오던 소식이지만, <언프리티 랩스타>는 근 10년 만에 제작되는 방송이다.
<언프리티 랩스타>는 <힙합 프린세스>라는 부제로 개편을 했다. 한일 양국의 여성 래퍼들이 참가해 경쟁을 벌이고 최종적으로 아이돌 그룹을 결성해 데뷔한다고 한다. 힙합 서바이벌에 아이돌 오디션 시스템과 한일 합작 포맷을 융합한 셈인데, 이것이 ‘힙합 아이즈원’이라는 다소 기이한 수식어로 홍보되고 있다. 힙합도 아이돌도 오디션 방송도 새롭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흥행 공식을 교차 결합하며 포맷을 쥐어짜 낸 셈이다. 여기서 엿보이는 건 새로운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새로운 기획을 내놓아야 하는 엠넷 제작진들의 곤경이다.

엠넷의 곤경은 오래전부터 누적된 문제의 결말이라 할 만하다. 대국민 오디션 <슈퍼스타K>, 힙합 오디션 <쇼미더머니>의 성공에 이어 <프로듀스 101> 시리즈로 아이돌 오디션 시대를 열었을 때만 해도, 엠넷은 한국 상업문화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프로듀스> 투표 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오디션 명가의 기둥은 무너졌다. 그 후 기적처럼 등장한 구원투수가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즌1이었지만, 두 번째 시즌 <스트릿 맨 파이터>부터 흥행에 실패했고, 시즌을 반복하며 신선함과 화제성을 잃었다.
그 후 엠넷은 <프로듀스> 시리즈의 후신 격인 <걸스플래닛>, <보이즈 플래닛>, <아이랜드> 같은 아이돌 오디션 방송들을 선보였다. 하지만 <보이즈 플래닛>과 데뷔 그룹 제로베이스원이 남자 아이돌 시장의 탄탄한 소비자층을 등에 업고 살아남은 것을 제외하면 전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 후반기에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꺼내든 카드가 ‘힙합’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힙합 방송이란 포맷이 아니다. 방송을 떠나 힙합이라는 장르가 이미 사람들 관심사에서 멀어져 버렸다. <쇼미더머니>가 인기를 끌던 시절, 한국 힙합은 흥미롭고 트렌디한 젊음의 음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국힙은 더 이상 참신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식상하고 진부한 장르, 사람들의 조롱 섞인 농담에 오르내리는 문화가 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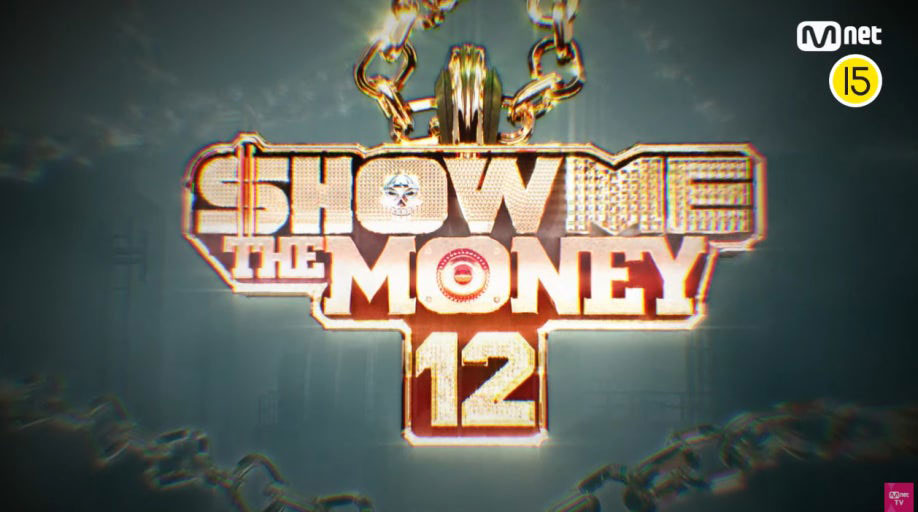
이는 단순히 장르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래퍼들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 숱한 기행과 추문, 논란이 이어지면서 힙합의 대외적 이미지는 오염됐다. 남들이 보기에 ‘멋있지’가 않은데 자기 멋에만 취한 말과 행동을 고집하니 남는 건 현실과 유리된 그들만의 세상이다. 시간적 텀을 둔 채 포맷의 생명력이 충전되었길 기대하고 힙합 서바이벌을 다시 만든다 한들 과거처럼 인기를 끌 수 있을 리 없다. 실제로 CJ E&M은 <쇼미더머니>가 중단된 기간 동안 티빙에서 <랩퍼블릭>이라는 힙합 방송을 만들었지만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나는 엠넷이 이런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 역시 문화시장의 동향을 알 것이고 여론을 살펴볼 테니 말이다. 알고 있음에도 잠재력이 고갈된 장르를 소환하며 편성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대안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 말이다. 돌이켜 보면, 엠넷의 방송 제작 전략은 문화적 블루오션을 포착해 상업 문화계 중심부로 끌어올리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역사적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성공시켰지만 더 이상 끌고 올 수 있는 문화 분야가 남아 있지 않다. 일반인 노래경연, 힙합, 밴드, 아이돌, 댄스까지 음악방송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소비했다.
이건 근본적으로 엠넷이 방송의 연출을 통해 승부를 걸기보다는 소재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재가 주는 흥미가 사라지고 나니 방송이 주는 재미도 사라지고 이전의 기획을 반복하는 것 말고는 타개책이 없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엠넷이 예전 같은 히트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물론 엠넷 내부에만 원인이 있지는 않다. 문화 콘텐츠 생태계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플랫폼 경쟁에서 열세에 처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상파는 물론 다른 케이블 방송사들은 여전히 롱런하는 방송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화제작을 뽑아내고 있다. 그들과 엠넷의 차이는 콘텐츠 퀄리티와 방송이 주는 신뢰감에 있다. 여기엔 당장의 화제성만 노려 온 선정적 연출과 투표 조작 사태가 남긴 악명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물론이다. 국내든 해외든 시청자들은 엠넷 하면 ‘악마의 편집’이나 ‘투표 조작’을 떠올리지 누구도 ‘웰메이드’ 같은 키워드를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엠넷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헤쳐 갈 대안이 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장르의 부활이나 흘러간 카드의 재활용을 넘어서 방송 제작의 기본과 정론을 돌아보는 것이다. 잘 기획된 포맷, 자신이 다루는 문화에 대한 존중, 이 방송이 재밌더라고 입소문을 부르고 평판을 회복할 수 있는 콘텐츠… 엠넷이 잃어버린 것은 당장의 방송 흥행이 아니라 더 뿌리 깊은 신뢰다. 쉽게 말해, 이 채널의 방송은 어떤 의미에서든 ‘믿고 볼 수 있다’는 직관적인 평판 말이다. 시청자들의 신뢰를 되찾지 못한다면, 힙합이든 아이돌이든 그 어떤 도돌이표 같은 기획도 쓸모를 발휘할 수 없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