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일에 볼까 했지만 기왕이면 3.1절에 보기로 하고 식구들 모두에게 예고를 했다. <귀향>의 돌풍이 예고된 바 있어서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맞았다. 그렇지만 극장에 들어가서는 놀라야 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객이 객석을 채웠고, 그들 속에는 나이 어린 학생들 모습이 많아 더 뭉클했다.
깊지는 않으나 조정래 감독과는 오래 전의 인연이 있었다. 영화판이 아니라 길소리 판소리판이었다. 2002년 즈음 인사동에는 일요일이면 젊은 소리꾼들이 자진해서 모여 지나는 시민들을 끌어 모았다. 그런 소리꾼들 사이에 사람 좋은 표정으로 추임새를 넣는 고수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귀향>의 감독 조정래였다.

소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북장단을 맞추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판소리계에는 1고수 2명창이라는 말도 전한다. 그만큼 한국전통음악에 대한 애정과 열의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애정은 국악 클레이 애니메이션 ‘동화세상’을 제작하는 결과까지 이어졌다.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많은 시간이 흐른 뒤 화제의 영화 <귀향>의 감독이라는 사실을 남을 통해 들으니 소회가 새삼스럽고 괜히 미안하기도 했다.
어쨌든 그 기억 속의 조정래 감독의 따뜻한 인상은 영화에 그대로 담겼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귀향>을 너무 무거울까봐, 너무 슬플까봐 걱정스러워 보기가 두렵다는 말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물론 14살, 15살의 어린소녀들의 지옥을 보는 일이니 즐거울 수는 없다. 계속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는 또 슬픔이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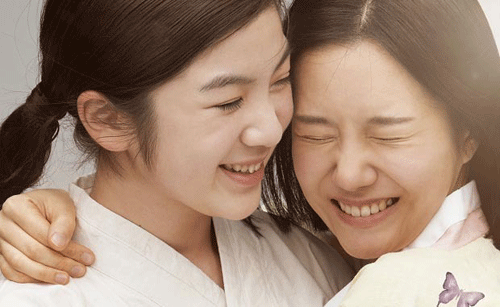
그러나 영화가 다 끝난 후에는 오히려 그 모든 감정들이 따뜻한 무엇으로 결합되는 기분이 들었다. 여전히 가슴에는 분노와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지만 이 영화가 가고자 하는 마지막 지점은 분노와 슬픔보다는 포스터의 두 소녀들처럼 따뜻하게 손잡고 가자는 것 같다. 마지막 장면에서의 슬프면서 따뜻했던 대사가 그랬다. 영화관을 나오면서 무겁지만은 않고 그래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가능했었을 것이다.
사실 <귀향>에 대해서 워낙 많은 글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워낙 영화는 보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번에도 <귀향>은 그저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흐릿한 기억 속의 선한 웃음의 그 청년 조정래를 한 번 더 칭찬하고 싶어졌다. 특히 지금까지도 국악에 대한 애정이 여전함에 뿌듯했다.

이제 조정래 감독은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아니 더 중요하고 힘 있는 영화감독이 되기를 바란다.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같은 영화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영화판에 조정래 감독에게서 그 희망을 보게 된다. 얼마 전 심하게 망한 판소리 영화 <도리화가>가 떠오른다.
만약 조정래 감독에게 그 영화를 맡겼다면 결과는 다를 수 있었을 것이다. 흥행까지는 몰라도 판소리의 맛과 멋 그리고 그 한까지 제대로 필름 속에 담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단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귀향>의 장면 하나는 모처럼 소녀들이 물가에 발을 담그고 쉴 때 부른 노래였다. 상당히 현대적인 ‘가시리’였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강권순의 ‘산천초목’이 떠올랐다. 그러나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다.
어쨌든 영화 <귀향>은 개인적으로는 오래 전에 알던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다. 듣고도 쉬이 믿지 못할 14년의 집념까지는 사실 몰랐지만, 영화를 계속할 사람이었기에 언젠가 극장서 그의 작품을 보게 될까 기대하다가 잊고 말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영화를 만들었다. 그것도 꼭 필요한 때에 딱 맞춰서 말이다. 운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신념의 결과일 것이다. 그 조정래가 <귀향>이 끝난 후에도 좋은 영화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