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다.”
앵커의 또 다른 이름, 전설의 앵커 월터 크롱카이트의 말이라고 한다. 얼핏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다른 것이었다. 요즘처럼 그 다름을 절실하게 느끼는 때도 없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언론은 침묵하고, 국민은 알 권리를 요구하느라 SNS가 뜨겁다.
그런 언론을 바라보면 30년 전 '말'지 사건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권력의 언론통제 증거인 ‘보도지침’을 세상을 알린 것은 요즘은 많이 잊혀진 ‘말’지였다. ‘말’지는 80년 해직언론인, 진보적 출판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만들었다. 1986년 ‘말’지의 보도지침 사례 폭로는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언론통폐합에 이은 언론통제수단을 고발한 것으로 이 역시 대량 구속 사태로 이어졌고, 많은 시국사건이 그렇듯 9년 뒤 모두 무죄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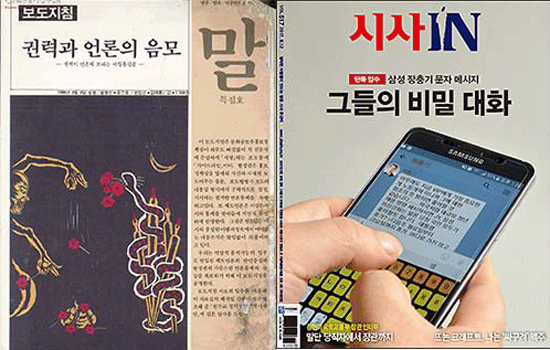
전두환 정권 앞에 진실은 아주 여린 힘에 불과했다. 언론의 자유도 그러했다. 단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 이기지 못한다고 싸우기를 두려워하던 때는 아니었다. 오히려 더한 각오와 독기로 독재정권과 싸웠던 시대였고, 언론도 한쪽에서는 무너졌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치열하게 투쟁했던 때였다. 그리고 '말'지의 보도지침 폭로는 언론자유를 향해 싸운 숭고한 역사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피 흘려 지켜낸 언론의 자유가 요즘 얼마나 우스워졌는가. 국민들이 뽑은 적폐에 언론이 두 번째에 올라서기도 한다. 게다가 진보언론들마저 그 적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언론의 자유의지를 먼저 물어야 할 시대가 됐다. 언론의 자유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이다. 그래도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겠지만 그 언론에 대한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는 시대이다.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와 상충되는 현실과 직면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우선 2012년 국정원 댓글팀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권력의 여론조작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시사인은 삼성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언론 임직원들의 아부와 청탁 문자를 폭로했다. 언론의 가치가 얼마나 싸구려였나 보여줬다.

언론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권력과 재벌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굴종하는 현실에 언론의 자유란 말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시사인의 폭로로 드러난 재벌에 대한 언론의 자발적 굴종. 심지어 언론사 인사개입까지 드러났다. 그런데도 언론은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잠잠하다. 이 엄청난 특종에 대부분의 언론들은 입을 닫았다. 잘못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이나 다름없다.
뉴욕타임스가 세계적 명성을 갖게 된 데에는 철저한 사과를 가장 먼저 꼽는다. 꼭 그래서가 아니라 뉴욕타임스는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과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큰 만큼 사과의 책임도 똑같이 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균형이다.
뉴욕타임스의 명성은 모든 언론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명성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당장 오늘도 가능하다. 적어도 누리는 자유만큼의 반성은 좀 하자. 그것은 SNS를 하지 않는 국민들도 장충기 문자 사건을 알도록 기사를 쓰는 것이다. 많이 쓰면 포털도 마냥 숨기지는 못한다.
|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