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식으로 빙빙 돌아도, 결국 여기. 이렇게 돼요. 나도 수아 씨도. 다녀왔어요. 이제 집에 온 기분이 드네.”
뭘 어떻게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인간의 감정이 그렇다. 아무리 밉다 밉다 하려고 해도 억지로는 되지 않고, 억지로 해봐도 싫은 아니 감정이 없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면 그때는 감정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럴 때 자위한다는 것이 “그까짓 감정이 뭐라고” 정도지만 정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감정을 포기한다고 또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봇이 아닌 인간은 어떤 특정 부분만 삭제할 수 없는 유기적 동물이니 어쩔 수가 없다. 전통적 가치관에서라면 수아에게 주어진 선택은 단 하나뿐일 것이다. 참고, 죽이고, 딸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사는 것 같지 않더라도 그냥 사는 것. 지금 그 가치를 수아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

수아는 결국 딸 효은을 혼자 뉴질랜드로 보내고, 자기감정을 선택했다. 인생에 딱 한 번, 한 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때 정말 딱 한 번 수아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로 죽을힘을 다해 결심했다. 그렇다고 딸에게 미안하지 않을 수 없는 수아는 남이 보든 말든 눈물을 쏟는다.
그것을 보고 수아의 모성이 작다고 말할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각자가 선 위치에 따라 다를 것 같다. 그러나 세상에 하고 많은 호칭 중에서 ‘자네’라고 아내를 부르는 남자, 일단 불거진 문제를 아주 먼 곳으로 격리시켜 놓고는 복수를 벼르는 남자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모성이란 줄로 포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그래도 딸 효은에게는 미안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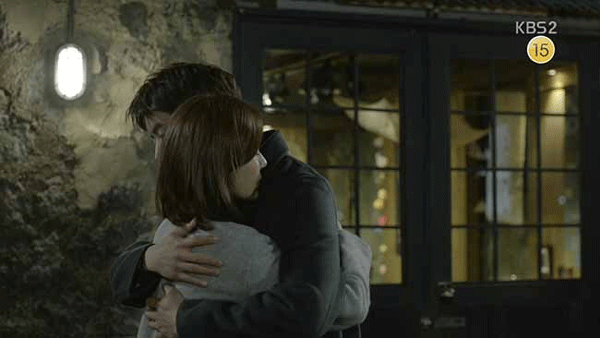
그 미안함과 슬픔이 하도 커서 된 ‘보든 말든’이었지만 수아에게는 더 많은 상황에서 이 ‘보든 말든’에 익숙해져야 한다. 도우와 함께할 때는 괜히 들떠서 먼저 말하기도 하지만 정작 손잡고 걷다가 아는 사람이 나타나자 가장 먼저 쑥스러워지고, 이 ‘보든 말든’이 정말 안 되는 수아지만 이제 익숙해져야 한다.
KBS2 수목드라마 <공항 가는 길>이 벌써 마지막 회만을 남기게 됐다. 드라마에 좀처럼 집중하기 힘든 환경에서도 이 드라마만은 놓치지 않으려 무던 애를 썼다는 것이 종영을 앞둔 한 시청자의 첫 번째 감회지만 아마도 많이들 공감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의 무엇이 그렇게 좋았는지 새삼 생각해보게 된다. 로맨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불륜이라는 죄의식과 함께 전개된 두 사람의 로맨스는 분명 보통 드라마의 연애와 다르기는 했다. 매우 조심스럽게 아니 섬세하게 발전되어가는 두 사람의 마음이 진도 빼기에 급급한 로맨스와 차별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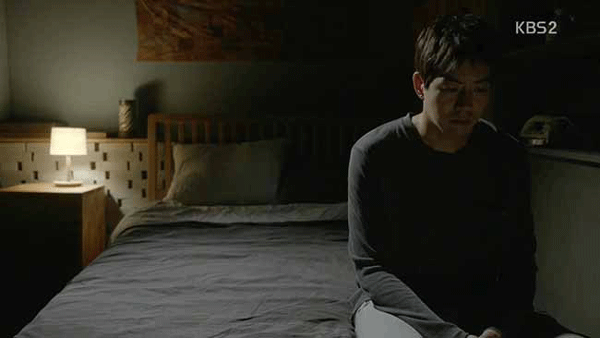
이 드라마에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을 앞둔 시점까지 가장 깊이 남는 기억은 사람에 대한 대단히 선하고, 깊은 애정으로 바라본 카메라의 시선이다. 김하늘, 이상윤 두 배우의 진지하고 절제된 연기도 참 좋았지만 그들 연기를 가까이서 때로는 한발 뒤에서 방해주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다 보였던 카메라의 그 숱한 명장면들을 오랫동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심지어 평범한 방 안의 한 컷도 지나쳐 찍지 않은,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그런 의도와 실천이 만든 <공항 가는 길>의 많은 장면들은 배우들의 명연기와 잘 어우러져서 영화 못지않은 뛰어난 영상미로 불륜이라는 주제를 격정에 쏠리지 않도록 잘 조절해준 미덕을 갖는다. 보통 드라마가 작가와 배우만 보이기 십상인데 이 드라마에서는 모처럼 드라마를 구성하는 연출, 촬영, 조명 등등 모든 요소가 고루 돋보였다는 점을 꼭 칭찬하고 싶었다.
|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