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홍보담당자들은 “기자님들 때문에 죽겠다”고 한다. 그래서 때때로 기자들의 갑질에 대해 제보하기도 한다. 홍보팀은 점심에 기자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하고(또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취향별 커피까지 대령해야 한다), 저녁에는 술상을 차려야 한다. 기념품과 상품권을 가장 먼저 챙겨줘야 하는 것도 출입기자들이다. 평소에 기자들의 특성도 잘 파악해야 하고, 명절 때면 선물세트도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기사도 대신 써줘야 한다.
물론 가장 큰 관리도구는 광고와 협찬이다. 언론사 광고담당자들(바로 기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광고를 확인하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 삐치지 않게 잘 나눠야 한다. 몰래 한 협찬이더라도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는 탓에 조심해야 한다. 평소에 이렇게 관리하고 관계를 맺어둬야 기사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거나, 회장님 사진과 이름을 내릴 수 있다. 언론을 활용해 경쟁사를 저격하는 ‘언론플레이’나 기사를 가장한 광고는 관계의 산물이다.
기업을 괴롭히는 언론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자실에서 송고하기 전 기사를 출력한 A4 용지를 흔들며 “이거, 그대로 나갑니다” 하면서 기사와 광고를 바꾸려는 기자들도 있다. 홍보담당자들은 “조중동, 매경, 한경, 그리고 종합편성채널도 무섭지만 인터넷언론이 더 심하다”고 말한다. 업계 전체 매출은 급감하는데 매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기자들의 최우선 업무는 이제 기사가 아니라 광고·협찬을 따내는 일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이 언론에 대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긴장이든 유착이든, 공생이든 기생이든 기업과 언론의 관계는 원래 이랬다. 기업에게 언론은 ‘리스크’이고, 기업은 언론을 관리해야 한다. 관리도 그럭저럭 잘 해왔다. 대다수의 언론이 이미 기업에 포섭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이 주도하는 출입기자단은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과 긴장관계인 매체는 전체 매체 수 증가에 비례해 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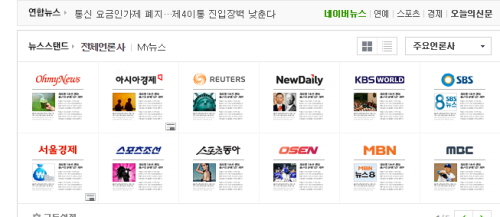
한국광고주협회와 메트로의 갈등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은 그래서 기업과 언론이 아니라 정부다. 이른바 사이비언론 프레임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른바 유사언론행위와 사이비언론을 둘러싼 최근의 파문은 정부의 언론 대응 정책이 강경하게 변하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 정부는 기업을 대변하는 수준을 이미 넘었다. 기업의 사이비언론 퇴출 요구는 오히려 청와대가 앞장 서 추진하는 언론 정책의 패키지 상품 정도로 보는 게 맞다.
박근혜 정부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스스로 검열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내부에서는 “언론사 등록요건을 강화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포털은 뉴스 제휴 방식을 바꾸기로 했고, 최상위 댓글을 정부부처와 기업에게 넘기면서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이 정부는 보수언론과 재계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포털과 호흡도 척척 맞는다.
문제는 이 동맹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미디어 업계 전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언론행위는 늘어날 게 빤하다. 1등 신문 조선일보의 실적을 보더라도 그렇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30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전체 종합일간지의 68.02% 수준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실적을 견인한 것은 신문이 아니라 ‘사업’이다. 사이비 경쟁은 임계점을 넘었고 심해질 게 분명하다. 기업과 포털이 져야할 리스크는 더 늘어난다.
당장 192개 유사언론을 조사하고도 발표를 못하는 상황이다. 주요일간지, 보수신문, 종합편성채널이 유사언론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발표를 못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동맹은 가장 밑단에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언론은 정부와 기업에게 밥그릇마저 내준 랩독(lap dog)이 된다. 마치 자신만은 정론지인양 연기하는 것은 생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반(反)사이비 동맹에 동참하는 진짜 사이비언론이 더 늘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