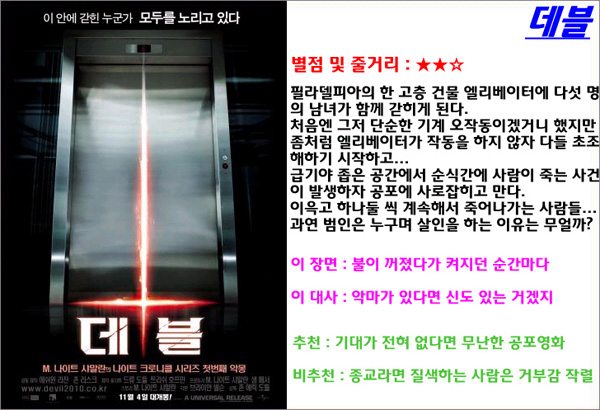
이렇게 영화로서 가질 수 있는 특혜를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밀하고도 기발한 시나리오가 필수적입니다. 무릇 영화에 있어서 시나리오의 완성도는 기본적인 요소지만 시작부터 스스로 한계를 세운 영화라면 더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화에 꽤 흥미를 가지는 편이며 <데블>도 같은 이유에서 개봉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데블>은 제 기대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는 영화였습니다. <큐브, 쏘우>보다 더 제한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 흥미를 돋우기에 충분했지만, 엄밀히 말해 <데블>은 기존 공포영화의 공식에 더 충실합니다.
일단 정작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이렇다 할 전개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각양각색의 인간군상을 모아서 <큐브>의 그것을 연상하게 했으나 사실 이러한 설정은 이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큐브>만 해도 후속편을 통해 늘 동일한 설정을 밑바탕에 깔고 들어갔으니까 관객으로서는 이미 족히 세 편 이상을 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은 색다른 이야기를 기대했건만... <데블>은 치밀하지도, 기발하지도 않은 시나리오에서 출발한 영화라 만족을 얻기에 한참 부족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색다르긴 색다릅니다. 난데없이 종교적인 색체를 강하게 띈 영화로 전환해버리니 그것도 새롭다면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처음부터 내레이션이 등장했지만 설마 이것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교적인 색체가 뚜렷하거나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데블>은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종교에 얽매여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그냥 이상하게 보이도록 놔두는 수준이라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연출 또한 시나리오의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공포라는 장르의 틀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으로 흥미를 끌었던 영화가 흔하디 흔한 공포영화(오컬트?)를 답습하는 모양새로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설교를 앞세우는 영화라면 비종교인으로서는 반발심만 커질 텐데 말입니다.
<라스트 에어벤더>로 혹평을 면치 못했던 샤말란이 제작과 원안에 참여한 <데블>로 만회를 하나 했는데 역부족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