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삼성전자가 일명 '그린화 작업' 전략을 수립하고, 노조원이 많은 협력업체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의 노조 와해 공작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연루된 삼성전자 관계자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왜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글로벌 기업이 '무노조' 원칙을 고수해왔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노조혐오' 부추기기에 나섰다.
28일자 조선일보는 <민노총 강성 노조 있었다면 삼성·포스코 신화 가능했을까> 사설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경과를 전하면서 "수사 규모나 기소 규모 다 유례가 없다"며 "친 노동으로 기울어진 이 정부 들어 민노총이 그동안 진출하지 못했던 대기업에 속속 뿌리를 박고 있다"고 비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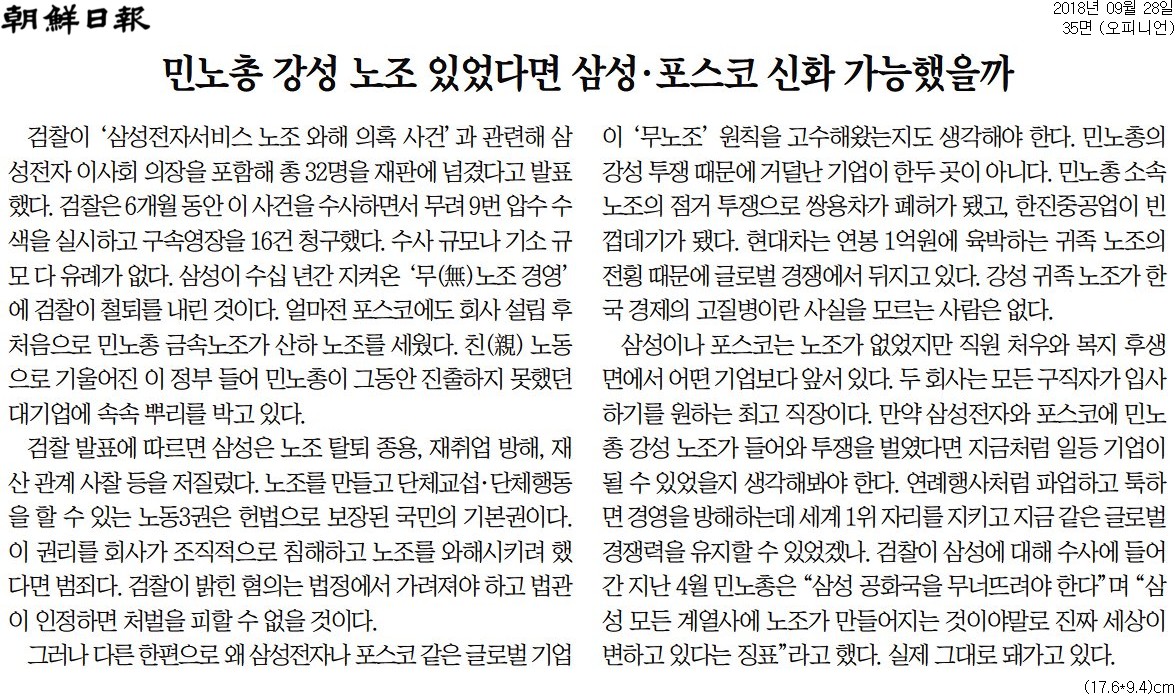
조선일보는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3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 권리를 회사가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면 범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왜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글로벌 기업이 '무노조' 원칙을 고수해왔는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민노총의 강성 투쟁 때문에 거덜난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민노총 소속 노조의 점거 투쟁으로 쌍용차가 폐허가 됐고, 한진중공업이 빈 껍데기가 됐다. 현대차는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귀족 노조의 전횡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강성 귀족 노조가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만약 삼성전자와 포스코에 민노총 강성 노조가 들어와 투쟁을 벌였다면 지금처럼 일등 기업이 될 수 있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연례행사처럼 파업하고 툭하면 경영을 방해하는데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지금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삼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지난 4월 민노총은 '삼성 공화국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삼성 모든 계열사에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징표'라고 했다"며 "실제 그대로 돼가고 있다"고 썼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노동권에 대한 인식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말로는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듯하지만, 결국 무노조 경영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웠다는 식의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노조 와해 공작' 드러난 삼성, 노동기본권 인식 달라져야> 사설을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그룹 미래전략실을 컨트롤타워로 해 일사분란하게 실행된 노조 와해 공작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이 노조를 탄압하겠다고 '전사적 역량'을 끌어모았다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헌법은 노동자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조를 만들어 단체교섭·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모든 사용자가 노조를 파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감독·감시가 절실함은 더 말할 나위 없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마침내 법의 심판대 서는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 사설에서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그들의 평소 주장대로 '삼성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군사작전 같은 방해공작을 통해 폭력적으로 유지한 모래성 같은 '신화'였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행동한 자'만 처벌하고 '지시한 자'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며 "에버랜드 등 남은 계열사 수사에서 더 윗선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엄정한 판단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