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인의 호칭을 두고 야기된 독자와 언론의 대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게다가 다른 언론에도 불이 옮겨 붙어 점차 진보언론 전부와 시민과의 전투를 벌이는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한겨레21 편집장을 역임했던 기자가 페이스북에 “덤벼라 문빠”라면서 군복에 소총을 든 표지를 게재하면서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아마도 한겨레21 이번 호 표지에 대한 독자들의 불만에 속이 상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들로서도 못할 말은 아니었다.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대통령의 사진 중에 고른 사진이 어떤 부정적 의도를 느끼게 한다. 지지자라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독자니까 당연하다. 그러나 기자는 독자를 문빠라고 불렀고, 덤비라고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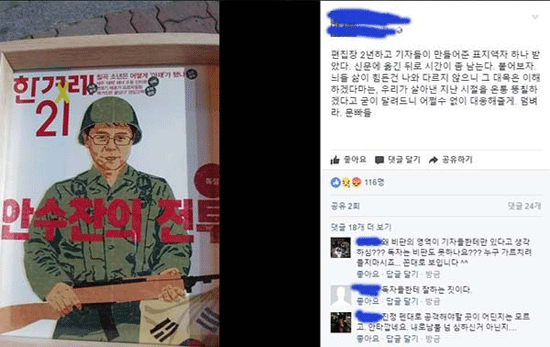
해당 글은 그리 오래지 않아 자진 삭제되었다. 사과도 있었다. 음주로 인한 실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주가 어떤 잘못의 변명이 되는 시대는 아니다. 어쨌든 총을 들고 덤벼라를 외친 그 게시글이 번듯한 언론사의 편집장까지 지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에 경악하게 되고, 참혹한 심정에 빠지게 된다. 유독 그의 손에 들린 소총이 눈에 거슬린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김정숙 여사 호칭 문제로 독자와 설전이 벌어진 오마이뉴스 일도 더욱 껄끄럽게 됐다. 아니 그렇게 자초했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해당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걸면서 “59% 국민여러분 양해해주세요^^”라고 해 말썽이 됐다. 말 그대로를 인정하더라도 국민 41%라고 조롱해도 되는 것 아니다.
애초에 잘못은 기자 자신이 범했다. 김정숙 여사의 호칭에 이의를 제기한 독자들에게 해명한 회사 내부 방침으로 ‘~씨’로 하기로 정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전 정권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 여사로 표기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일본 수상 아베의 부인에게도 친절하게 여사라고 했다. 이쯤 모순이 드러났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겠다고 몸을 낮추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었고, 그랬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다. 근거를 제시하고 따지는 독자에게 적대감을 드러낸 것은 납득하기 힘든 점이다.
물론 기자 입장에서도 상처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다수로부터 받은 상처가 복잡한 고통을 준다는 것은 글 쓰는 사람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 위로를 하고 싶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항의한 모두를 문빠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니 문빠가 과연 존재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문빠란 그저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가져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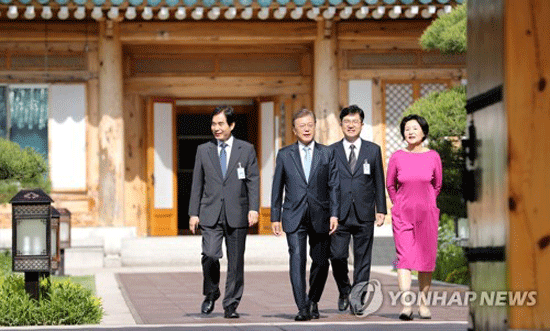
어쨌든 그쯤에서 그쳤으면 그나마 좋았을 것이나 오마이뉴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다음날 한 기사의 워딩은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독자들을 더욱 자극했다. 마치 야구에서 동료를 대신해서 빈볼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관저로 이사해 첫 출근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근황을 알리는 기사였다. 그런데 대통령과 부인을 묘사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름까지 생략했다. 이런 식이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4분 주영훈 경호실장,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일정총괄팀장, 부인 김씨와 함께 관저에서 나왔다’
문재인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 내외를 무시하려고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아니 딱 봐도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의문은 한 발짝 더 나간다. 위 한 문장에 등장하는 네 명 중 남성들에게는 긴 직책도 모두 설명했지만 여성인 김정숙 여사만 ‘부인 김씨’로 처리했다. 또한 남성들은 대통령 문씨, 경호실장 주씨, 일정총괄팀장 송씨가 아닌데 김정숙 여사만 ‘부인 김씨’일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여성은 좀 그래도 된다는 생각인 것인가.
사태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결과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이 끝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언론이 질 수밖에 없고, 져야만 하는 것임을 밝혀두고 싶다. 언론이 아무리 상황에 따라 절대권력도 비판할 수 있다지만 그것도 매체로서 독자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언론은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고독한 선지자가 아니다. 따라서 언론이 독자와 싸우자는 것은 결기가 아니라 객기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벌이는 싸움이라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라도 독자에게, 시민에게 겸손할 의향은 없는지.
|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