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후안무치, 파렴치한, 안하무인... 후배들은 물론이고 선배들도 따가운 질책의 시선을 보낼 것은 뻔한데 그는 버틴다. 내가 이기나 니가 이기나 두고 보자는 것 같다. 물론 거기서 너는 온 국민이고, 그리 길지는 않지만 우리 법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 결국 ‘너’인 우리 국민이나 우리 법의 역사는 계속해서 똥물을 뒤집어쓰고 있다.
법원의 이런 모습에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우리는 검찰의 후안무치를 봤다.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전 검찰을 경험했던 김두식 교수가 쓴 ‘불멸의 신성가족’은 우리 사법부의 문제를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도 사라져가는 촌지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받는 사법부의 구태를 읽으면서 화를 넘어서는 동정이 일 정도였다. 그리고 우리는 새 검찰총장의 인선과정에서 다시 한 번 그 추악한 모습을 보고, 끌탕을 찬 기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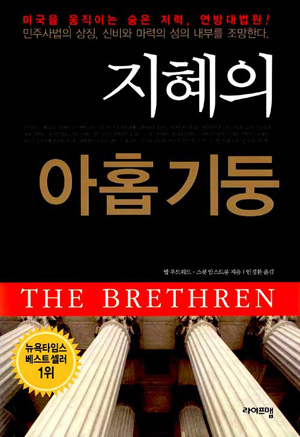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법조직은 9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관이다. 우리로 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권위를 합친 정도의 위치에 있는 조직이다. 때문에 이 아홉기둥이 잘못되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교수도 제목은 ‘지혜의 아홉기둥’으로 했을 것이다. 이 책의 원제는 ‘THE BRETHREN'(동업자들)이다.
후안무치의 대변인 같은 이가 신임 대법관으로 앉아서 꼼짝하지 않는 현실. 친 삼성의 인사들로 불릴 만한 이가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대법관의 현실 등등을 보면 ‘아 사법 개혁은 정말 멀고도 험하구나’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럴수록 우리가 그토록 숭앙하는 미국의 현실은 어떨까를 살핀다. 그러고는 아 역시 저 정도라도 하니까 미국이 버티구나 하는 인식과 함께 부러움도 느끼게 된다.
우선 저자인 밥 우드워드는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해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언론인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02년 9ㆍ11테러 이후 미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심층 기획보도로 다른 기자들과 함께 퓰리처상을 공동 수상해 그가 살아있는 신화임을 증명했다. 이 책의 공저자인 스캇 암스트롱도 ‘워싱턴포스트’의 기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Information Trust의 사장이다.
이 둘이 관심을 가진 1969년부터 76년까지는 2백년 역사의 미국 사법부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평가받는다. 베트남 전쟁, 흑백 갈등, 문화 충돌, 워터 게이트 등의 굵직한 사건들이 산재한 시기이다. 미국 사법 측면에서 봤을 때도 덕을 갖춘 워렌 법원이 퇴진하고, 닉슨에 의해 지명되어 조금 떨어진 버거 원장의 주도 아래 새로운 시대조류를 반영하는 과도기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37대 대통령인 닉슨(재임 1969~1974)의 재임기간이다. 반공주의자로 알려진 닉슨은 최고 법률기관인 연방대법원을 장악하려 했고, 결국 다양한 논의 끝에 그의 극단적 보수주의가 종말을 고하는 시간이다.
이 책은 연방대법원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했다. 1969년에 이슈가 된 ‘분리교육을 철폐’ 문제, 1971년에 표현의 자유 문제를 이끈 음란물의 규제 범위, 1972년의 낙태판사 문제, 1973년의 워터게이트 판결까지의 다양한 이슈를 통해 미국 사법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의 초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등이 지명하는 연방대법관의 자질 문제로 인한 인선 과정이다. 최고 법원의 표 한 표, 한 표는 미국 사법의 양심이었고, 그랬기에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작은 흠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때로는 사상적인 중립성까지도 검증받는다. 그런 점에서 신영철 같은 이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자조를 넘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탁월한 리더쉽으로 미국 사법을 이끌다가 69년 퇴임한 대법원장 워렌은 “대법원은 현실 상황에 맞추어 우리 헌법에 담긴 영속적인 원칙을 발전시키는 곳입니다. 대법원은 오직 ‘공익’에만 봉사하며, 오직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인도될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반면에 우리 대법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던 날 몰지각한 삼성의 추악을 덮어주면서 돈 앞에 백기투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비참한 사건임에도 그다지 주목받지 조차 못하고 슬픈 울음 속에 묻혀 버렸다.
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워터게이트’의 처리 과정을 보면 법원내에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지가 나와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에는 닉슨이 지명한 네명의 판사(버거, 렌퀴스트, 파웰, 블랙먼)에 맞서는 브레넌, 더글라스, 스튜어트, 마샬이 있고, 중도에 있는 바이런 화이트가 이 문제를 심판한다. 보수와 진보로 구분될 4명씩이 있고, 중간에 화이트가 있어서 균형을 맞추던 시기다.
하지만 대통령 문제인 만큼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반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때문에 스튜어트 등은 처음부터 만장일치 전술을 택했다. 재선이던 닉슨은 이미 사건의 주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통해 그 위기를 벗어나려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해임되는 게 정당했다. 닉슨이 지명한 연방법관들 가운데 버거 원장의 반대와 블랙먼의 이탈 가능성이 보였지만 결국 끊질긴 노력으로 닉슨의 불법에 관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그리고 17일 닉슨은 사임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이미 신영철을 비롯해 재벌의 돈으로 부양되던 이들이 최고사법기관을 장악했다. 이들이 과연 워터게이트 앞에서 양심을 보인 미국 연방대법관들처럼 약심있는 판결을 해줄지가 의문이다. 실제로 어제 통과된 미디어법도 그들이 심판할 상황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고양이들에게 생선을 맡기는 불안한 꼴이 됐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대리투표까지 횡횡한 이번 날치기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대가 암울한 것은 이제 신영철 같은 이들이 있는 기관의 심판을 바라봐야 현실이다. 어떻든 이제 양심을 지킬 마지막 보루까지 막혀있는 상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지켜야할 14개(대법원장 포함)의 기둥 중에 이미 절반은 썩어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통탄스럽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