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늘자 한겨레 9면에 “전교조,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않기로”라는 기사가 떴다.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쪽에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전교조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전교조가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9일 저녁부터 자체 조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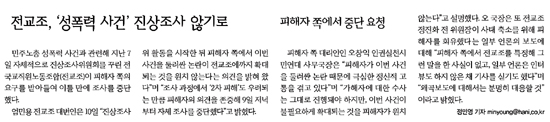
한겨레는 또 ‘정진화 전 위원장이 사태 축소를 위해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 측 대리인인 오창익 인권실천연대 사무국장의 말을 빌려 “피해자 쪽에서 전교조를 특정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일부 언론은 인터뷰도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싣기도 했다”며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 기사 내용처럼 피해자 쪽에서 “전교조를 특정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교조가 이번 사건의 전면에 등장했을까? 지난 5일 열린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대리인의 입장’ 기자회견에서도 ‘전교조’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상하다. 그렇다면 ‘전교조’는 언제부터 등장한 것이지? 그래서 오늘자 신문에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전교조가 언제부터 왜 등장했는지 찾아봤다.
언론은 이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언론보도에서 ‘전교조’가 등장한 것은 2월 5일자 연합뉴스에서 처음 발견된다. 연합뉴스는 이날 ‘민노총 간부, 전교조 교사 성폭행기도 파문’이란 기사를 통해 “피해 여성은 당시 경찰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이 위원장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해준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온 시각은 오전 10시 52분.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대리인의 입장’ 기자회견이 진행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언론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신분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신분을 나타냈을까? 그렇지도 않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은 “A씨(피해자)의 소속 연맹 위원장과 같은 연맹 소속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A씨는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였다”고 못박았다. 때문에 피해자 측은 “민주노총 본부 간부들과 피해자 A씨 소속 연맹의 위원장과 핵심간부들의 전원 사퇴도 요구한다”는 입장이었다. 기자회견 어디에도 ‘전교조’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더 많은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어떻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것일까? 이것이야 말로 언론매체들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밝혀야 하는 진실이다.
전교조로 확장된 언론보도는 어떻게 흘렀나
그러나 이미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던 언론은 피해자의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소속 연맹 지도부에서도 압력을 받았다”는 발언을 토대로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교조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이미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한 전교조 간부가 현 전교조인지 아니면 전 전교조 간부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로 쏠렸다. 이에 가장 열성적인 매체는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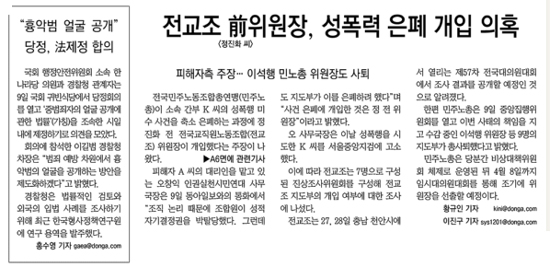
<동아일보>는 지난 10일자 1면 “전교조 전위원장, 성폭력 은폐 개입 의혹”이라는 기사에서 오창익 피해자 대리인의 인터뷰를 통해 “조직 논리 때문에 조합원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했다”며 “그런데 지도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은폐에 개입한 것은 정 전 위원장이라는 오창익 대리인의 말을 함께 전달했다.
이를 조선일보에서 “간부 K씨의 성폭행 미수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과정에 정진화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동아일보가 10일 보도했다”라고 동아일보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기도.
여론에 몰린 전교조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향이었다. 전교조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질 경우 자신에게 2차 피해의 위험이 있을 거란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피해자였다. 피해자 측은 더 이상 ‘전교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으로 몰렸던 것이다. 때문에 피해자는 전교조의 진상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하루 만에 진상조사는 끝이 났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매체는 또다시 전교조가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조사중단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의혹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이제는 언론이 2차 가해자
성폭력 사건의 기본은 ‘피해자중심원칙’에 있다. 물론 이것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사건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언론들은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얼마나 보호했나.
언론들은 서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인용하고 확대하기에 바빴다. 피해자에 의해 먼저 ‘전교조’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매체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어느 지역의 선생님이며 그동안 ‘전교조’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가 매체를 통해 유통됐고 피해자의 사진이 어디에 올라와 있다는 것까지도 공개하고 나섰다.
그리고 2차 피해를 우려해 전교조에 대한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피해자 쪽이 이야기했음에도 끊임없이 전교조에 대한 책임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쯤 되면 가장 집요하고 늦게까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전교조를 2차 가해 주범으로 몰고 있는 언론 자신이다.
생각해 보면,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행태는 경기서남부 연쇄살인 피의자 강아무개씨에 대한 보도행태와 닿아 있다. 마치 자신들이 재판관인양, 강씨는 연쇄살인범이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고 공개재판에 넘겨야 한다던 언론매체들이 민주노총의 성폭력 피해자인 A씨의 신상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공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딱 이만큼이 개념 없는 언론매체들의 ‘인권’ 개념이고, 강씨 얼굴 공개에 대해 국민 알권리 운운하고 있는 그들의 진짜 인권 감수성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