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30년 전 그대로지만 민간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세상의 흐름을 읽어냈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본들, 제도가 민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뒷북치기일 뿐이다.” 홍수용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20일자 신문에 쓴 칼럼의 일부다. 이 칼럼의 제목은 <감독 대통령, 각본 부총리의 ‘노동개혁 드라마’>인데,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취지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복기해보자. 한국노총은 지난해 대타협의 주역이였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에서의 입법이 늦어지자 기습적으로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피크제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이 앞장 서서 연일 고강도의 발언을 쏟아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또한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발언을 연이어 해댔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박근혜 정부 특유의 지침 정치(시행령 정치)와 여론전으로 우회해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부는 저상과자 해고와 임금피크제 등 정규직을 직접 겨냥하는 지침을 발표해버렸다.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으로서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피크제를 강행하는 것은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을 두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버렸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당장 피해는 비정규직과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의 길은 막힌다.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날아간다. 기업의 인력 운용도 엉망이 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노동계만 바라보며 노동개혁을 더 미뤄둘 수는 없다”고 선동했다. 조선일보는 합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며 노사합의 없이 노동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채질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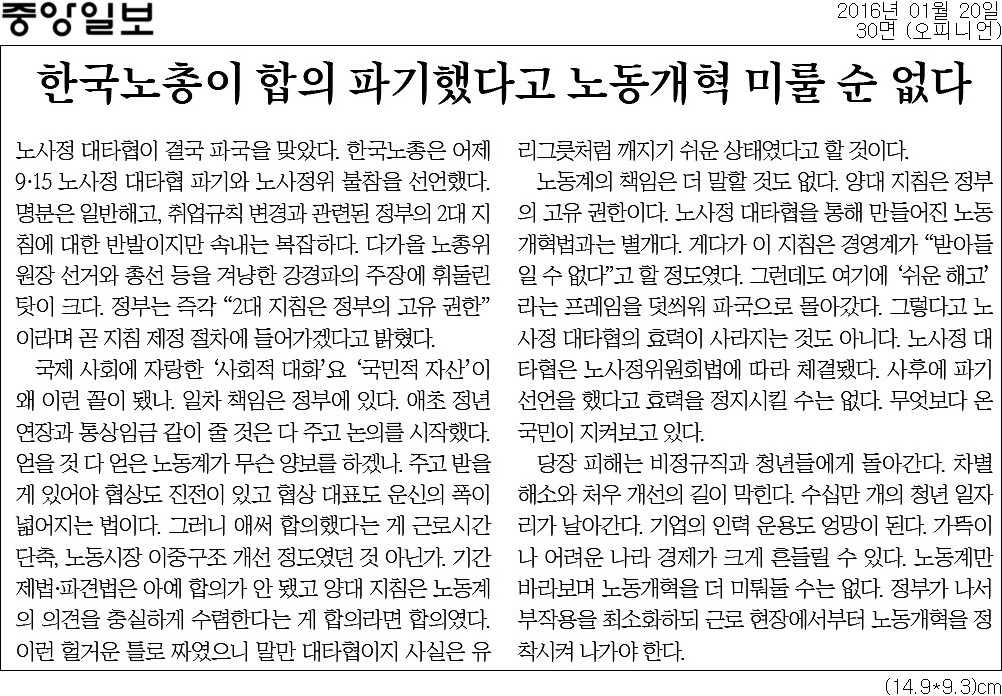
그러나 애초 노사정합의의 내용은 중앙일보의 지적대로 “기간제법·파견법은 아예 합의가 안 됐고 양대 지침은 노동계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한다는 게 합의라면 합의”였다. 기간제법 또한 2년짜리 계약직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 더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간제법을 포기하면서까지 우선 처리해 달라는 파견법의 타깃 또한 정규직이다.
“민간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세상의 흐름을 읽어냈다”는 동아일보 홍수용 논설위원의 분석은 어찌 보면 객관적일지 모른다. 정부 지침 이전에도 여러 기업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성과자 해고를 시행하고 있었다. 일례로 KT는 저성과자를 C-Player로 규정하고 저성과-경고-저성과-전환배치-사직유도 같은 ‘학대해고’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KT 노사는 저성과자에 대한 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정리해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희망퇴직을 접수했던 두산인프라코어의 사례처럼, 회사를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게 지금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도 많다.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할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에 목을 메는 이유를 설명하는 길은 ‘재계와의 유착’밖에는 없다. 동아일보 칼럼에는 지난해 여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석에서 한 말이 들어 있다. “꼭 관철해야 하는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째 호봉제 중심의 임금구조를 성과급체계로 바꾸고, 둘째 강성노조가 있는 현실에서 파견을 통한 대체근로를 자유롭게 해줘서 기업이 노조에 대항력을 갖추도록 해줘야 합니다.” 결국 정부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성과로 관리하고, 노조를 깰 수 있는 제도를 최우선으로 마련해주겠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철저하게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비교적 정부에 협조적이었던 한국노총마저 항명한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동아일보 홍수용 논설위원은 “정부 시나리오대로라면 당분간 한국에서 정규직은 개혁의 집중 타깃이 될 것이다”라고 썼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정규직,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노총이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노동에 미래는 없다.
언론은 노동개혁 드라마의 조연쯤 된다. 노동개혁의 본질을 이처럼 냉정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언론이라면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버린다고 비난할 때가 아니다. 헌법에 있는 노동권을 망가뜨리려는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 기업에게 금융자산을 늘리지 말고 고용에 투자를 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라고 압박해야 한다. 기자도 파견 대상으로 만드려는 파견법 개악에 반대해야 한다. 기업은 항상 한발 더 앞서 나갔고, 언론은 부채질을 했고, 정부는 그때마다 노동법을 고쳐줬다. 노동자의 권리는 30년 전에서 멈춰 있다. 이번에도 같은 장면이 반복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