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우리나라 언론의 주요 지면을 장식한 내용 중 하나가 미국의 언론 기업의 파산보호 신청이었다. 올해로 설립된 지 161년 된 미국의 언론기업 트리뷴 컴퍼니(Tribune Company)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광고수입의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12월8일 미국 델러웨어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미국의 금융기관과 자동차산업에 이어 언론사까지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트리뷴 컴퍼니는 ‘거대’ 아닌 ‘중형’ 미디어그룹

미국에는 약 60여 개의 중·대형 미디어 그룹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디즈니(Disney), 바이어컴(Viacom), 타임워너(Time Warner), 뉴스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 버틀스만(Bertelsmann AG), 제너럴 일렉트릭 (General Electric) 등 6개 언론 그룹이 거대 미디어 그룹에 속한다. 이들 6개 거대 미디어 그룹이 미국 미디어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고, 54개 중형 미디어 그룹이 나머지 시장인 10%를 나누어서 차지하고 있어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54개 중형 미디어 그룹에 속하는 트리뷴 컴퍼니는 미국 미디어 시장의 10% 중의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는 중형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 따라서, 트리뷴 컴퍼니의 파산보호 신청이 미국의 언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6개의 거대 미디어 그룹으로까지 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예측이다. 신문, TV, 라디오, 잡지, 인터넷, 위성방송, 출판사, 영화사, 케이블방송 등 미국 미디어 시장에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거대 미디어 그룹들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산신청을 할 만큼 위험한 위치에 놓여있지 않다.
신방 겸영 등 언론의 시장 논리가 부른 결과
그렇다면, 트리뷴 컴퍼니는 왜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된 것일까? 표면적인 이유는 트리뷴 컴퍼니의 전통적인 주력상품이었던 종이신문이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독자들과 광고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됨에 따라 주요 수입원이었던 광고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수입의 감소가 161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트리뷴 컴퍼니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의 전부일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유가 숨어있다. 트리뷴 컴퍼니가 파산보호 신청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언론을 산업의 논리와 자본주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로 내몰아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킨 미국 정부의 언론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사업가는 누구나 언론시장에 뛰어들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사 간의 인수 합병에 대한 규제와 제도를 철폐하여 언론사 간의 사업확장 경쟁을 부추긴 미국의 언론 정책이 결국 언론 기업의 파산보호 신청이라는 결과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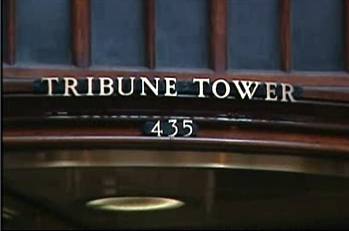
부동산업자인 샘 젤에게 트리뷴 컴퍼니는 어떤 의미였을까?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윤 창출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샘 젤에게 트리뷴 컴퍼니는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언론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의무는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 정부가 언론을 산업의 논리나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일반 기업들과 다르게 규제와 제도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언론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언론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면, 샘 젤처럼 돈을 벌기 위해 언론사업에 뛰어들어 언론 기업을 파산보호 신청까지 이르게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안은 미국 실패 답습일 뿐
언론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언론 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언론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된다.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사회권력의 감시 등 공공의 이익창출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기업이 언론 산업에 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언론 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언론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