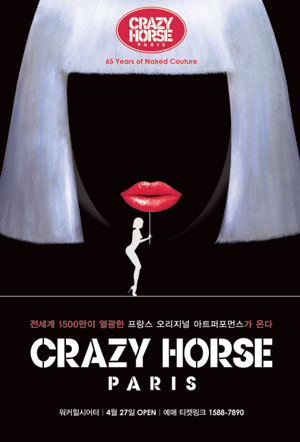
크레이지 호스의 스타트를 알리는 맨 처음 레퍼토리는 ‘갓 세이브 아워 베어스킨(God save our bareskin)’, 번역하면 ‘신이여 알몸을 구하소서’ 정도가 된다. 무슨 알몸을 구해달라는 것일까? 크레이지 호스의 무용수들은 영국 근위병의 모자를 쓰고 등장한다. 그런데 모자 아래에 입고 있어야 할 영국 근위병의 빨간 제복 대신에 여성의 맨살이 자리한다.
필자는 프랑스에서 크레이지 호스를 본 적은 없지만 ‘갓 세이브 아워 베어스킨’에 대한 기시감은 있었다. 소피 마르소가 주연한 어느 영화의 비디오테이프를 보았을 때 크레이지 호스의 ‘갓 세이브 아워 베어스킨’이 영화의 맨 처음에 등장했던 것. 어린 마음에 문화적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었기에, 크레이지 호스의 첫 번째 퍼포먼스를 보면서 소피 마르소의 영화를 되새길 수 있었다.
무용수들의 나신이 단지 관능적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건 프랑스 특유의 미적 센스를 덧입힌 공이 크다. 레퍼토리 ‘피크 어 부(Peek a boo)'에서 무용수는 분명 토플리스 차림이다. 하지만 무용수의 몸과 얼굴의 조명이 다르게 비치는 덕에, 마치 무용수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착시현상이 든다. 조명이 무용수의 옷이 되는 셈이다.

크레이지 호스는 벗는 게 다가 아닌 공연이다. ‘피-플라이(P-Fly)’에는 여성 무용수가 아닌 남성 댄서가 등장한다. 그런데 남자 무용수가 ‘고무줄 인간’이다. 줄넘기처럼 남자 무용수의 팔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가 하면, 빗자루를 잡은 두 팔이 360도 꼬이기도 한다. 연달아 등장하는 여성 무용수의 나신이 식상해지는 걸 막기 위한 정서적 환기 차원에서 남자 무용수를 등장시킨 게 아닌가 싶다.

발레나 현대무용과 같은 기교적인 테크닉을 크레이지 호스에서 선보임으로 크레이지 호스가 아트 누드쇼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만들었다. 동작 하나 하나를 위해 발레나 현대무용까지 소화해야 하는 무용수의 노력은, 호수 위에서는 우아하게 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부단하게 헤엄쳐야 하는 백조를 연상하게 만들었다.
무용수의 노력은 무용 기술 연마가 다가 아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체중도 검사받아야 한다. 기술 연마와 체중 조절이라는 ‘현대판 수도승’ 같은 무용수 덕에 크레이지 호스에 ‘아트’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늘 이성과 감성의 공존을 꿈꾸고자 혹은 디오니시즘을 바라며 우뇌의 쿠데타를 꿈꾸지만 항상 좌뇌에 진압당하는 아폴로니즘의 역설을 겪는 비평가. http://blog.daum.net/js7keie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