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언론과 기자는 저마다 객관성과 팩트를 강조한다. 그래도 독자는 안다. ‘그들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사실을. 자신을 능동적 수용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은 선호하는 방송뉴스를 직접 찾아본다. 스마트폰으로 매체를 직접 선택한다.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뉴스를 읽는다. 그런데 이상하다. 신문 하나 읽던 시절보다 시사문제에 더 깜깜해졌다. 기사를 읽고 나면 누군가를 욕하기는 쉽지만 제대로 된 비판은 못하는 그런 스마트한 시대다. 뉴스를 솎아주는 ‘큐레이팅’ 매체들도 많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페친, 트친이 좋은 뉴스를 공유하지만 사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도대체 뉴스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답은 현장에 있다. <미디어스>는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현직 기자들에게 뉴스 읽는 방법을 물어보기로 했다. 2편은 경제기사 읽기다. 경제기사에는 유독 알다가도 모를 숫자들과 업계 관계자가 많다. 기업들은 경쟁기업에 대한 정보를 흘리며 자객질을 시키기도 한다. <미디어스>는 한 유력 매체 경제부 기자에게 경제기사 읽는 방법을 물었다.
미디어스) 경제기사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기자들도 즐겨 읽지 않는다. 숫자가 너무 많기도 하고, 일단 이해하기도 어렵다.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경제뉴스를 어떻게 읽나.
출입처가 유지되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실인 만큼 본인의 출입처와 관련된 기사를 두루 읽는 편이다. 특히 경제 관련 기사는 다른 기사에 비해 수명이 짧은 편이어서 인쇄매체 보다는 인터넷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제 관련 온라인 매체가 최근 수년새 많아진데다 기존 전통 매체들도 기사의 특성상 인터넷 콘텐츠에 큰 비중을 두는 추세와 맞물린다.
경제뉴스가 기본적으로 숫자와 통계가 기본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숫자와 통계 자체가 객관이나 사안의 실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숫자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상당히 객관적인 팩트로 보이지만 그런 속성과 인식의 포장 때문에 독자가 속아 넘어가기 좋고, 어떤 경우엔 정치적 의도를 숫자라는 수단을 내세워 언론이 독자를 쉽게 속일 수 있어서다.
제대로된 기자라면 그 숫자의 이면에 담긴 정치적 함의와 정책의 의도, 오류 등을 간파해야 할 것이지만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지식은 물론 다른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다년 간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기사는 특히 ‘00년만에 최고, 최대’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반드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경험상 이런 제목을 단 기사의 절반 이상이 기자의 의도로 숫자가 왜곡된 기사였다. 게다가 00년만에 최고라고 해도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라는 실소가 나오는 기사도 하나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제기사는 반드시 읽어야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은 숫자로 항상 대중을 호도하려 하는데다 경제만큼 우리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는 없는 탓이다.
미디어스) 경제뉴스를 어떻게 쓰는지 알면 읽는데도 도움이 된다. 보통 경제·증권부 기자들은 아이템은 어떻게 잡고 어떻게 기사를 쓰나.
경제정책이나 산업을 담당하는 기자들은 출입처 보도자료와 통계를 많이 의존한다. 거시경제의 경우 통계치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기자 개인이 절대 할 수 없다. 정부가 통계치를 속이지 않고 그 통계치를 산출하는데 산입하거나 무시한 조건을 되도록 많이 공개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 증권 쪽은 항상 반복되는 이벤트가 있는 출입처여서 기계적인 기사가 일단 상당수다. 수많은 경제 매체들의 증권기사를 보라. 포맷까지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지 않던가.
기사 아이템은 기자 개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출입처에 의존해야 한다. 누구나 한마디 할 수 있는 정치나 사회 분야 기사와 달리 경제는 공부하지 않으면 ‘일자무식’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부 기사의 경우 어떤 범죄를 하면 인신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아 벌을 받는다는 메커니즘은 굳이 형사소송법을 몰라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금산분리법이나 증권거래법 같은 법률은 공부하지 않으면 제아무리 천재라도 모를 게 아닌가. 기자가 모르면 출입처의 논리를 답습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기사가 휘말리게 된다. 불행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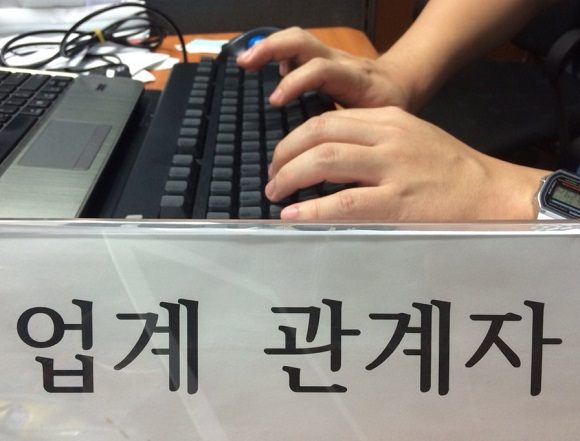
미디어스) 정치기사에 ‘여당 핵심관계자’가 있다면 경제기사에는 ‘업계 관계자’가 있다. 경쟁업체를 ‘저격’하는 기사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기사에 등장하는 관계자들을 도대체 누구인가.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면 기자 본인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몇몇으로 추릴 수 있지만 업계 관계자는 특정할 수 없지 않겠나. 그만큼 익명의 유혹이 크다.
미디어스) 경제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이유는 출입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사가 많고, ‘엿 바꿔 먹은 기사’도 많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전설은 신문이 모두 가판이 나왔을 때 생겨난 것이 대부분인데 수도 없이 많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기사가 공급되기 때문에 가판시절보다 기사의 수정과 삭제, ‘엿 바꿔먹음’이 더 용이해졌다. 그것을 노리고 기사를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보통 대기업의 경우 오너와 그 일가에 대한 기사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기사에 대한 ‘엿’의 요구가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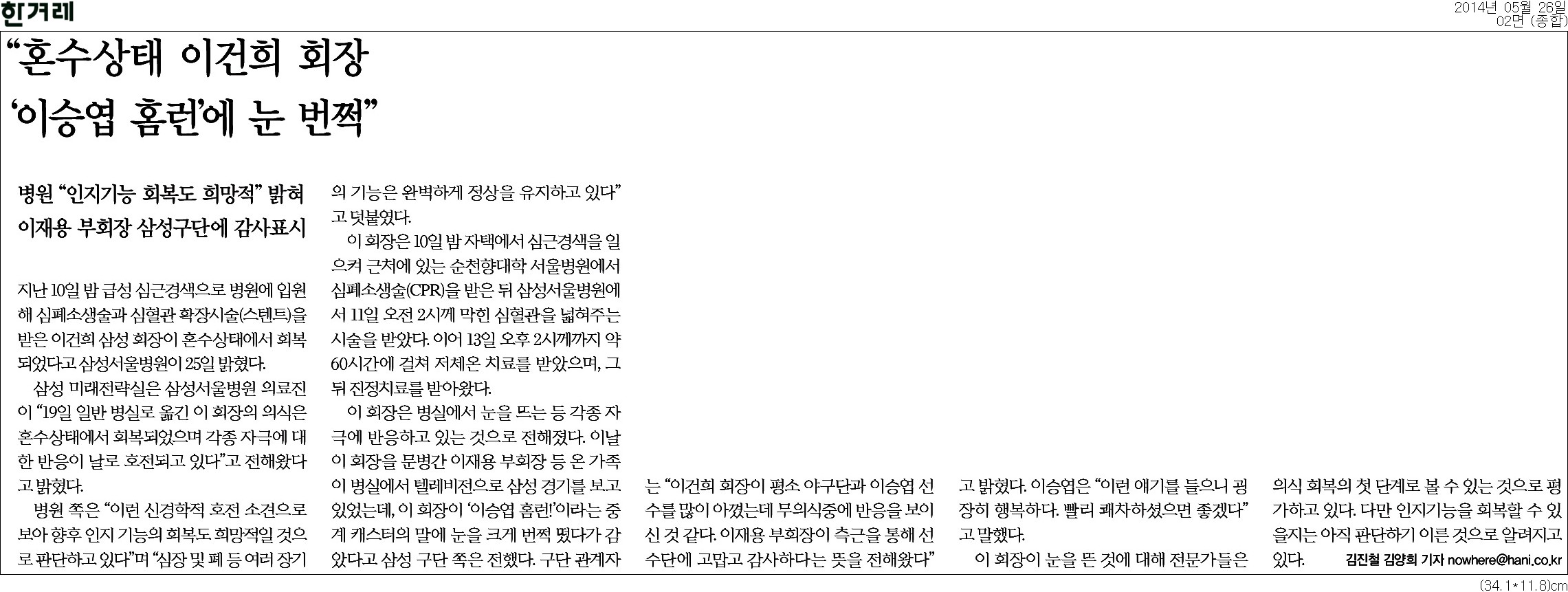
미디어스) 삼성 등 대기업 관련 아이템을 보면 심각하다. 심지어 진보를 표방하는 한겨레도 ‘이승엽 홈런에 이건희 회장 눈 떴다’는 기사를 크게 쓴다. 현장에서 느끼는 광고주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간단히 환율 기사를 보라. 환율이 떨어지면(원화절상) 나라가 망하나? 그런데 환율이 1천 원대 초반으로 떨어지기만해도 당장 경기가 비상인 것처럼 호들갑 아닌가. 환율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보면 된다.
미디어스) 정부부처들이 각종 통계와 함께 보도자료를 내놓으면 언론은 모두 똑같은 기사를 쓴다. 사실 통신사든 일간지 등 천편일률이다. 독자들은 경제 기사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모든 경제 기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숫자의 이면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광고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국내 언론 상황에서 독자 스스로 똑똑해지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미디어스)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경제 관련 언론이 있다면. 예를 들면 스트레이트 기사는 여기서 읽고, 해설은 저기서 읽어라, 세계경제 동향은 여기서 읽는 게 좋다는 식으로.
국내 매체의 기사보다는 증권사나 경제관련 연구소,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읽어보는 게 낫다. 물론 이런 경우도 증권사라는 특수성, 해당 연구소나 시민단체의 성향을 고려해 어느 정도 보정을 하고 봐야 한다. 정부 정책 관련 기사라면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보도자료 원문을 일독하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