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에 대한 관심은 딱 한미FTA까지였다. 전기 가스 수도 의료 철도 교육 등 공공부문에 대한 ‘공적 통제’가 사라지고 있지만 “민영화 반대” 구호는 항상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다. 운동진영 내부에서도 “냉정하게 보면 요즘 한국의 노동조합과 운동단체들은 ‘민영화 반대’ 연극의 일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은 민영화에 대한 화두를 던졌지만 곧 사그라졌다.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 레드북스. 문화연대가 주최한 <지금, 공공성 포럼>에 참석한 운동진영 전문가들의 진단도 같았다. <공공성>(2014년 3월, 책세상)이라는 책을 쓴 하승우씨가 살고 있는 충북 옥천의 공공재 사정은 이렇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LP를 쓰는데 2월에만 요금이 60만 원 넘었다. 상수도 보급률은 80%가 채 안 된다. 열차역에는 무궁화호만 서는데 그나마 이것도 줄고 있다.”
한국의 시민들은 고지서를 제대로 읽지 않는다. 아르헨티나 시민들처럼 요금이 ‘확’ 오르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 TV에 민영화 문제가 나오면 “또 뭘 해먹으려고?”라는 푸념을 늘어놓는 정도다. 하승우씨는 “공공성, 공공재를 자신의 삶에서 벗어난 (거대담론) 문제로 생각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아르헨티나처럼 사건이 터진 뒤에야 ‘그때 알았어야 했다’며 후일담처럼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조용하다. 20여 곳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운영·관리를 ‘물기업’에 위탁했고, 가스공사는 대기업 가스사업자에 밀려 ‘공공도매업’을 못할 위기에 놓였고, ‘민영화 포석’ 철도 쪼개기가 추진 중이고, 정부가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그 몫을 삼성 등 대기업에게 넘길 준비를 끝났는데도 이상하게 조용하다. 영화 <블랙딜>을 제작한 고영재 PD는 “한국인의 메커니즘은 이미 민영화됐다”고 지적했다.
주범은 블랙딜(검은거래)을 하는 정치인 관료 기업이다. 그런데 무기력한 상황을 만든 범인은 따로 있다. 공공부문 ‘어용’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에 블랙딜을 눈감고, ‘민주노조’는 오늘도 조직사수에 바쁘다. 권력과 자본을 감시, 추적해야 할 시민단체와 언론은 조직도 실력도 변변찮다. 어쩌다 ‘뻥파업’ ‘범국민대회’ ‘탐사보도’에 나서지만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는 없다. ‘괴담’ 유포자 취급만 받는다.
민영화론자들의 논리는 “방만한 공공부문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면 재정 적자도 줄이고 삶의 질도 올라간다”는 것으로 ‘민영화의 여인’ 영국 대처 시절과 그대로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 말대로 정부 관료들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봉쇄하고, 주민들이 공공성을 이야기하면 ‘국유화’로 왜곡해 선전하고, 밀양 송전탑을 지역주민이기주의로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을 ‘공익’ 담당자로 포장”한다.
김철 연구실장은 “예를 들어 철도민영화는 요금 인상과 서비스 하락 같이 삶과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광역버스 입석 금지 문제를 보자. 결국 없던 일이 됐지만 버스노동자 노동권과 버스회사의 수익, 공공교통 수단에 대한 문제는 정부에 떠넘겨졌다. 한국 사회는 정부와 지자체를 ‘공익’ 담당자로 지정하면서 스스로 공적 통제권을 내려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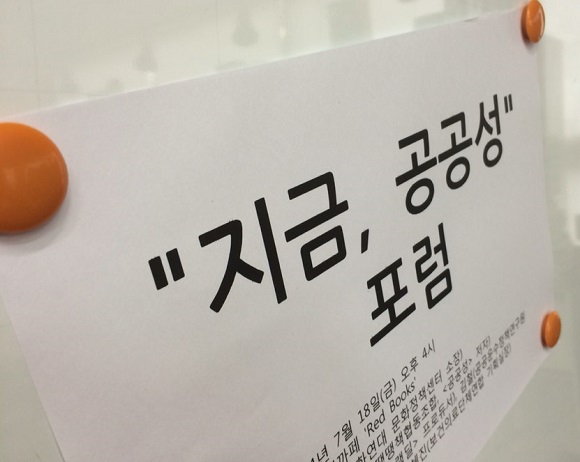
의료민영화도 마찬가지.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10%(병상 기준), 의료보험 보장률은 55%로 OECD 선진국 평균(70~80%)에 미달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이런 상황이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게 정상인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의료법인 자회사에 사실상 모든 영리사업을 허용하고, 컴퓨터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진료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변혜진 실장은 “지금까지 병원이 환자를 시간으로 착취했다면 이제는 병원이 공간을 활용해 병원에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게 하면서 공간을 착취하는 형태로 의료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영리화를 추진 10년 동안 지역의 공공병원은 문을 닫거나 영리병원의 체인점이 됐다”고 소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민영화냐 아니냐’는 논쟁만 반복 중이다.
이번에도 진실게임만 반복하다 싸움이 끝날 판이다.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은 “10년째 진실게임만 하는 데에는 공공재 문제가 시민의 영역으로 못 가는 ‘전략’에 이유가 있다”며 “이슈가 터지면 파업을 하고 (시민과 운동단체들이) 확 달라붙는 방식이었는데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재 처장은 주민센터 같은 공적 공간에서 공공재를 다루는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우씨는 “정부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공공재에 대한 공적 통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주민과 진보정당이 공적 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영재 PD는 정부와 자본의 ‘블랙딜’ 메커니즘을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혜진 실장도 “한국 재벌의 역사는 민영화의 역사”라며 이 같은 사실을 짚는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랙딜 ‘피해자’ 시민과 정당, 시민단체들이 나서더라도 거리에 백만 명이 모이지 않으면 정부는 꿈쩍을 않는다. 공공부문 노동자 ‘당사자’ 없이는 민영화 반대 싸움, 시민들만 일상에서 소소하게 저항하는 상황에서 민영화는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민영화된 아르헨티나가 등장하는 영화 <블랙딜>을 공포영화로 본 관객들이 많다고 한다. 민영화 반대 연극만 하다가는 영화는 진짜 현실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