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씨와 건달들>은 <노트르담 드 파리> 혹은 <벽을 뚫는 남자>와 같은 프랑스 뮤지컬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위치하는 뮤지컬이다. 프랑스 뮤지컬이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노트르담 드 파리>와 <벽을 뚫는 남자>처럼 올 가을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두 프랑스 뮤지컬은 송스루, 노래가 대사를 완전히 대체한다.
반면 <아가씨와 건달들>은 다른 뮤지컬보다 대사에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 대사가 많은 뮤지컬을 선호하는가 혹은 넘버가 많은 뮤지컬을 선호하는가는 관객의 취향이겠지만 <아가씨와 건달들>은 올해 한국에 소개된 뮤지컬 중에서 대사가 가장 많은 작품에 속한다.
같은 뮤지컬 작품이라도 예전에 뮤지컬을 감상한 관객이 또 같은 작품을 찾는 이유는 둘 중 하나다. 캐스팅이 마음에 들거나, 달라진 연출을 감상하기 위해서다. 재연을 하더라도 <시카고> 같이 한결같은 풍미를 유지하는 뮤지컬이 있는가 하면, <베르테르>(이전에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다)처럼 연출의 방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공연의 맛이 확연히 달라지는 뮤지컬이 있다.

아들레이드는 사실 비련의 여주인공에 가까운 캐릭터다. 약혼자는 사귄 지 십 년도 아니고 무려 14년이나 되었지만 결혼할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어머니에게는 결혼했다는 거짓말도 모자라서 아이가 있다는 거짓 편지까지 보내야 하는 지경이다.
이제나 저제나 약혼자가 청혼할 거라는 기미가 보여야 희망이라도 갖겠건만, 약혼자라는 남자는 결혼식 당일에도 펑크 내기 일쑤일 정도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남자이다 보니 아들레이드는 사라처럼 생기발랄하기보다는 비련의 여주인공에 알맞은 캐릭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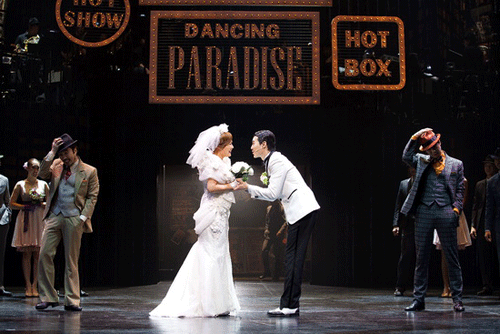
스타마케팅은 양날의 칼이다. 스타급 연예인 혹은 정상의 뮤지컬 스타가 무대에 오르느냐 아니냐에 따라 티켓파워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티켓 파워를 좌우하는 스타가 관객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연기력과 가창력을 선보인다면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을 터.
하지만 캐스팅된 스타가 연기력이나 가창력에서 다소 미흡한 면을 보이면 독이 든 성배가 된다. <아가씨와 건달들>에 캐스팅된 일부 배우는 가창력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이들의 가창력 미숙을 보완하는 건 신영숙의 저력이었다. 주연이 아닌 조연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주연을 능가하는 배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뮤지컬이 <아가씨와 건달들>이다.
| 늘 이성과 감성의 공존을 꿈꾸고자 혹은 디오니시즘을 바라며 우뇌의 쿠데타를 꿈꾸지만 항상 좌뇌에 진압당하는 아폴로니즘의 역설을 겪는 비평가. http://blog.daum.net/js7keie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