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월 22일 "신문고시 폐지 않겠다"고 밝혔답니다.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자리에서 백 위원장은 4월 13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자신의 발언 '신문고시 완화·폐지 검토'에 대해 "원론적으로 말했을 뿐이고 신문고시만을 겨냥한 검토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발 물러선 발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신문고시가 완화·폐지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일간지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신문고시의 불법 경품 처벌 수준을 더욱 세게 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마디 거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판매)고시(=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는 아시는대로 1996년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해 여름 7월, 중앙일보 지국 직원이 신문 보급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끝에 조선일보 지국 직원을 살해해 버린 사건이 탄생 배경입니다.
신문고시는 98년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한국신문협회의 황당한 주장에 밀려 사라졌다가 신문 판매 경쟁이 다시 심해진 2001년 되살아났습니다. 신문고시는 이듬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는 '경사'를 누렸는데 이유는 첫째가 '신문업계의 과당 경쟁 완화'였고 둘째는 '독자들의 선택권 보호'였습니다.
헌재 결정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신문고시는 '무한 돈줄 삼성'에 기대고 있는 중앙일보를 빼고 나면 모든 신문에게 도움이 되는 규정입니다. 조선이나 동아조차도, 불법 경품으로 시장을 떡칠해 한 때 효과를 반짝 낼 수는 있겠지만, '돈줄이 유한'한 그들로서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 불법 경품, 경남 한 시골 지국에서도 기세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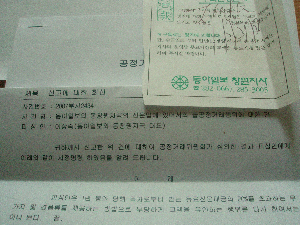
물론 여기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조선과 중앙과 동아가 제각각 지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신문 1년 구독료의 20%을 넘는 경품 또는 무가지 제공은 불법이라는 신문고시 규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품권 3만원(또는 2만원) 어치와 석 달 또는 넉 달치 신문 공짜 제공으로 해당 지역 신문시장을 오로지했습니다. 수도권보다 불법 금액이 작은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다른 신문 지국들이 들어서 말리면 잠깐 그만뒀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경품과 무가지를 들고나와 장터 거리와 시가지를 쓸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동아와 조선, 특히 동아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본사가 돈을 대주지 못해 그랬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만, 말로 하는 항의 말고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동아는 이렇게 중앙이 한 차례 쓸고 지나가면 독자가 30~50명이 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줄어든 독자는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아 지국은 사정이 어려워서, 합법으로 할 수 있는 '두 달치 공짜 신문'조차도, 독자 주문이 없으면 그냥 제공하지 않은 채 뭉개는 수준입니다.
조선도 물론 불법 경품(또는 무가지) 제공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2006년인가에 한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지역 동업자들의 항의를 받고 일단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항의를 중앙은 물론 하지 않았으며 동아를 비롯한 다른 신문 지국들만 했다고 합니다.
불법 경품으로 밥그릇 빼앗기는 시골 지국장들
신문 종사자 사이에 떠도는 얘기들이 사실임을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는 풍경입니다. '무한 돈줄' 삼성의 '식민 일간지' 중앙일보는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신문고시를 비웃으며 불법 경품을 뿌려댑니다. 조선은 그나마 따라가고는 있지만, 동아는 더 이상 따라갈 생각을 못하고 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끼워넣기 할 매체 '스포츠 동아'를 마련했다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스포츠 동아'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게다가 이 '찌라시'가 시골 지국까지는 제대로 못 올 것입니다. 정책 결정권자에게 현명함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시골 지국까지 보낼 생각은 아예 않을 것 같습니다.)
시골 지국에는 해당 신문 보급을 30년 안팎 해 온 60대 후반 지국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으로 바뀐 지국장도 적지 않습니만, 이런 60대 후반 지국장들은 대부분 다른 생업은 없이 신문 배달(때때로 전단 배포) 수입으로만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이들에게 중앙이 불법 경품을 한 번 뿌릴 때마다 줄어드는 독자 30-50명은 곧바로 한 달 수입 감소 15만-30만원이 돼서 돌아옵니다. 전체 부수가 얼마 되지 않는 시골 지국장에게 이 정도면 밥그릇 빼앗는 수준이 넘어 밥그릇 깨버리는 수준입니다. 불법 경품 살포가 한 번으로 그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매.배달의 분리나 신문유통원 활성화처럼, 효율 떨어지는 현행 배달 체계를 어떻게 대체하면 좋을까는 더욱 깊이 논의하고 검증해야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하나는 지금 같은 불법 경품 경쟁은 중앙을 뺀 모든 신문에 재앙이라는 점입니다.
백 위원장은 이 비릿한 냄새를 맡아야
우리 같은 지역 일간지는 말할 것도 없고 동아나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대로 내팽개쳐 둔다면 생계 위험에 내몰린 조선이나 동아의 지국들이, 그런 지국에 종사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극단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난 1996년과 같은 끔찍한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남 시골 지국에서 일어난(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장과 너무 멀리 있어서 이 비릿한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일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