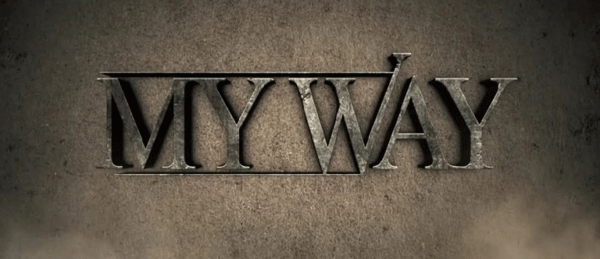
씨네 21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 본디 강제규 감독은 <요나>라는 SF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졌던 시점에 워너 브러더스의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마이 웨이>를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인이 노르망디까지, 그것도 독일군으로 참전하게 된 걸까요? 해당 인터뷰 기사를 보면 당시 몽골의 노몬한에서 소련과 몽골의 연합군 대 일본군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군 병사로 잡힌 한국인이 소련으로 끌려갔고, 다시 소련을 위해 전투에 나서게 되면서 모스크바에서 독일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기서 독일군에게 잡히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 노르망디까지 가게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있었을 법한 참말로 서글프고도 기구한 운명이죠?
여담입니다만, 스티븐 앰브로스라는 이름이 눈에 익어서 혹시 하고 찾아봤더니, 역시 그 유명한 미드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원작자가 맞더군요. <D-Day>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쓴 이후인 1994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마이 웨이> 칸영화제 제작보고회의 오프닝 영상
스케일도 스케일이지만 <마이 웨이>는 이야기의 분량도 상당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중국, 소련, 독일, 노르망디에다가 당시의 조선에서 벌어졌던 일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방대한 영화가 될 것이 틀림없어 우려도 생기는데, 강제규 감독이라면 일단 믿어보고 싶습니다. 사견에 불과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류의 에픽스러운 영화를 만드는 데는 강제규 감독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국내 최초의 액션 블럭 버스터랄 수 있는 <쉬리>나 <태극기 휘날리며>가 훌륭한 완성도를 지녔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적어도 수준급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마이 웨이> 칸영화제 제작보고회의 메이킹 영상
민감한 시대적 배경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정을 다뤘다고 해서 벌써부터 <마이 웨이>와 강제규 감독을 두고 비난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재만 놓고 벌써부터 속단하기는 이르니 우선 영화를 보고 논하도록 하죠. 설마 몇몇 분들의 말씀처럼 작심하고 군국주의 미화나 역사 왜곡 따위를 등장시킬 리는 없을 겁니다. 이미 소재부터 거부감을 줄 우려가 없지 않은데 그런 내용을 담았다가는 전 국민적인 반감을 사고 말 테니 말입니다.
이런 말을 감히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와는 별개로 인터뷰에서 엿본 강제규 감독의 의식과 각오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로부터 시달렸을 텐데 정작 본인은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차근차근 과정을 밟고 계셨군요. 아쉽게도 <마이 웨이>는 워너 브러더스가 손을 뗐다고 하지만 곧 할리우드에서 멋진 영화를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마이 웨이>도 흥행과 작품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영화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Q) 할리우드에 간 게 2006년이다. 그동안 한국 영화인들에게 빨리 신작을 내놓으라는 재촉을 많이 받았을 텐데.
A) 영화 찍기 싫은 감독이 어디 있겠나.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나의 결벽증 때문이다. 코미디를 제외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제의받았다. 내 에이전트를 통해 장르와 규모 상관없이 드라마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마음을 움직인 작품이 없었다. <마이웨이>는 아까 말했듯이, 그 다큐멘터리를 본 순간 가슴이 떨려왔다. 바로 한국에 전화해서 이거 무조건 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다. 그 정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영화를 만들 수는 없지 않나.
- 중략 -

A) 데뷔작이 동시에 졸업작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다. 미국에 얼마나 많은 감독이 있나. 한국 사람인 내가 전형적인 미국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언어와 문화에 대한 식견과 이해도 등등을 감안한다면 그들보다 잘 찍을 가망성은 별로 없다. 내가 만약 특별한 변별력이 없는 평범한 할리우드영화를 찍었다면 데뷔작이 졸업작이 됐던 수많은 유럽 감독과 그 외 아시아 감독들의 전철을 밟았을 거다.
참고 - 아시아에서는 서극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1980년대~1990년대에 전성기를 누리면서 할리우드로 건너갔지만, <더블 팀>과 <넉 오프>를 연출한 이후로 빛을 보지 못하고 허탈하게 홍콩으로 복귀했죠. 오우삼 또한 할리우드에 진출하면서 제일 먼저 연출했던 영화가 <하드 타겟>이었습니다. 다행히 오우삼은 차기작으로 <브로큰 애로우>를 찍으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재미있게도 두 감독 모두의 할리우드 첫 작품에서 장 클로드 반담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장 클로드 반담이 테스트 영화의 전문배우냐는 소리도 나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하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