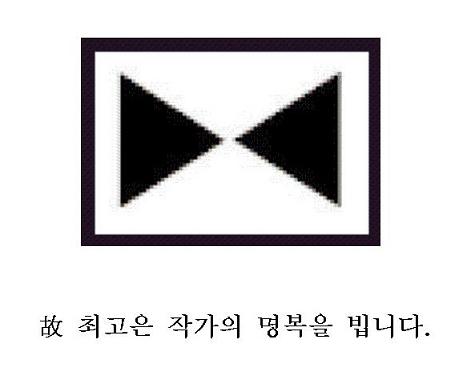
자기도 모르게 ‘악!’하는 소리 입에서 터져 나오던가? 전신에 오싹한 소름이 쫙 돋던가? 김치 쪼가리 기다리며 절망 속에 죽어간 그녀의 공포를 상상하니, 유서로 남긴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던가? 주변의 살아있는 자들을 새삼 다시 쳐다보게 되고, 소식 끊었던 못난 친구를 괜히 찾아보게 되던가? 어찌 저 지경이 되도록 놔뒀을까, 무심한 이웃사람들에 대해 끌끌 혀를 차며 원망했는가? 착취적인 영화판의 노동구조, 독점적인 영화제작의 현실에 함께 분개했는가? 아님 한 젊은 프리랜서의 안타까운 죽음에 인간적으로 동정심이 갔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애도’고 어쩌고 하니 괜히 불쾌감이 들어 인상 찌푸려지고 말던가? 사람 한 명 죽은 게 무슨 대수냐고, 영화 만들던 여자 시나리오 작가 한 명 죽었다고 왜 트위터 등에서 온통 난리냐는 그런 시큰둥한 생각이 들지 않던가?
혹시 그랬더라도 욕하지 않겠다. 당신에게 동정 즉 타자의 고통을 함께 하는 사회적 윤리를 기대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전문가. 냉정해야 할 기자고, 오직 사실만을 따져야 하는 언론인이시다. 진실을 추적하고 진실을 책임진 저널리스트들에게, 인간적 감상이 무슨 대수인가? 그래 사건은 어찌 처리했나? 단신으로 내보냈다고? <한겨레>를 옮기는 것 말고 뭐 뾰족이 할 게, 따로 할 말이 없었던가? 아직 뉴스로 만들지 못했다고? 그녀의 이력을 좀 더 취재해야 하고, 가족친지들과 주변 사람들 인터뷰도 따야 하며, 좋은 그림이 되도록 그녀가 다니던 학교를 찍고 그녀가 만들었다는 단편 필름도 입수해야 했는가? 그래서 오늘 저녁뉴스에 ‘젊은 여성 시나리오 작가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내 보낼 예정인가? 아님 ‘유망 프리랜서 작가, 아사’로 뽑을까 고민 중이시나?
설마 인터넷 조회해 보고는, 뉴스가치가 떨어지고 기사거리가 안 된다고 판단해 재껴 버리진 않았겠지. 그럴 당신들이 아니지 않은가? 얼마나 좋은 소재인가! 얼마나 자극적인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데, 이런 비극적인 아이템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나! 시청률을 올리기에 딱 맞는 기사, 가독률을 높이는 데 가장 잘 어울리는 뉴스다. 안타까운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각도로 대충 뽑으면 된다. ‘도시 청년 대중의 잉여적 삶과 죽음’이라는 해설 기사를 내놓을 수는 없지 않은가? 신자유주의시대 프리랜스 예술가의 위험한 삶을 분석해 보는 기사는 데스크로부터 퇴짜 맞기에 안성맞춤일 테고. 탈취에 의한 축적의 시대, 주변부 프롤레타리아트의 공통운명이라는 프레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인 줄 다 안다. 그렇지 아니한가, 기자 양반들?
그러니 어찌 당신들에게 죽음을 제대로 전하라 기대하겠는가. 당신들이 어찌 잇단 주검의 진실, 떼죽음의 진상을 달리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젊은 잉여적 존재들이 한 곳에 모여 한꺼번에 목숨을 끊는 놀라운 사태가 반복되어도 태연히 ‘연탄가스 집단자살’이라는 사실만 되풀이하는 앵무새 종족. 꽃다운 나이에 피 토하며 쓰러져 간, 누구로부터도 죽음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사라져간 삼성 반도체의 여성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당신들. 죽음의 비상사태를 옮길 진실한 언어를 잃어버린 부족. 300백만 생명들이 살처분되는 집단학살 현실도 병든 가축의 불행으로 외면해 버리는 냉정사회의 주축. ‘해적’의 목숨은 짐승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멤버들.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을 파리 떼처럼 날려버려 통쾌하고 자랑스럽다는 승전보를 읊으면서, 죽음에 직면했던 선장의 이야기는 묵살해버린 당신들이다.
그런 당신들이 이 시대 난쟁이들의 죽음을 말할 수 없다. 당신들의 권력에 취한 눈에는 도심을 뒤덮은 슬럼이 제대로 보이기는 하나? 그 많던 달동네가, 그 안의 수천만 빈민들이 대체 어디로 사라졌나 신기해하지 않았던가? 당신들은 귀머거리. 좌절하고 분노하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는커녕 지금 당장 살아가기 힘들어 외치는 수백만 잉여적 존재들의 저주가 들리지 않는다. 어디선가 죽음을 음모하는, 아니 대기 중인 사람들의 불길한 속삭임이 전해질리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비정규직이, 힘없는 프리랜서가, 그리고 직장에서 내쫒긴 부모에 빌붙어 연명하는 청년들이 함께 내지르는 ‘살고 싶다!’는,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는 원성이 어찌 들리리오. 고통과 죽음의 현실로부터 너무나 동떨어진 당신들, 이번 한 젊은 작가의 비극에 대해서도 그냥 입을 꾹 다무는 게 더 낫지 않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