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부는 지난 1996년 전력 규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장의 우월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첫째, 전력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평균 전력이 최소 20%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둘째, 전력산업의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과거 규제 하에서보다 환경보호는 더 잘 되면서, 서비스는 좋아지고 비용은 감소할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 그레그 팰러스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민주주의>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한다. “1999년 샌디에이고에 사시는 부모님이 전기요금청구서를 내게 보내주셨다. 규제 철폐가 이루어진 첫 해에 요금은 20%가 줄어들기는커녕 379%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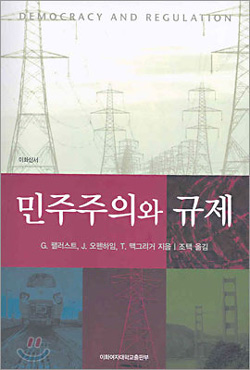
이것이 널리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재앙’의 실체다. 전력과 같은 공익사업(public utility)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민영화하자는 움직임은 지난 198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유행처럼 확산됐다. 규제는 그만두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시장주의자들은 규제받지 않는 시장이 전력과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레그 팰러스트를 비롯한 이 책의 저자들은 그것이 ‘값비싼 환상’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책이 씌어지던 2003년 현재, 공익사업의 규제 철폐를 실험했던 미국의 25개 주 가운데 최소 3분의 1이 정책의 ‘치유’에 착수했고, 아직 시장 실험을 시작하지 않은 2분의 1은 그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 공익사업 규제를 과거처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한다.

<민주주의와 규제>라는 제목이 붙은 이 책이 보여주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우리는 미국의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규제의 ‘규칙’이 아니라 규칙이 만들어지는 ‘방식(method)’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전력, 전화, 가스,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에서 저비용, 고품질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민주적 규제(democratic regulation)’다. 민주적 규제의 공식은 간단하다. 첫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완전하고 공개적인 접근. 둘째, 서비스 기준과 가격 결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완전한 참여.

하지만, 새 정부의 갖가지 청사진을 접할 때마다 자꾸만 ‘포퓰리즘’을 연상하게 되는 건 왜일까? 시장과 기업에 더 많은 자유를 주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을까? ‘국민적 합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려했던 상황이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실제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대비하여 볼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는 독재적으로 내려진 결정에 정통성을 주는 데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것도 안 할 때보다 더 나쁠 때도 많다.” 얼마 전 대운하와 관련해 1년으로 시한을 못 박아 놓고 추진한다는 인수위의 입장에 대해 한 시민단체 간부가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과 똑같다.
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완전하고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서비스 기준과 가격 결정 과정에 완전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자명하다. 물론 저자들이 말하는 미국의 모범적인 ‘민주적 규제’의 사례를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대입시키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긴이가 말한 것처럼, 시장의 대세를 좇아 민영화론과 규제 철폐를 찬성하는 이들에게도 이 책은 그 도저한 설득력으로 인해 ‘놀라움’을 준다.
|
||||||


